화롯불 속 흰 눈처럼 번뇌 사라지니
소 길들이는 채찍도 고삐도 필요 없고, 사람도 소도 모두 사라지니(鞭索人牛盡屬空)
푸른 하늘은 광활하여 오도(悟道)의 소식 전하기 어려워라(碧天遙信難通)
붉게 타는 화롯불 속의 흰 눈처럼 번뇌 없으니(紅爐焰上爭容雪)
이제야 조사의 깨달음에 이르네(到此方能合祖宗)
확암 사원(廓庵 師遠, 1103~1176)은 중국 남송시대 때 정주(鼎州) 양산사의 스님으로 〈십우도(十牛圖)〉를 저술했다. 십우도는 선가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목동(牧童)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는 과정에 비유해 10단계로 제시하는데 먼저 알기 쉽게 열 개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게송(선시)을 붙여서 구성됐다.
‘십우도’의 그림은 달마도와 함께 선화(禪畵)를 대표하고, 게송은 선시(禪詩)를 대표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불교미술과 예술, 그리고 시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선종의 구도자는 자신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찾아 부처가 되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는다.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암(확연하게 툭 트인 암자의 뜻이므로 ‘곽암’은 잘못된 이름이다) 선사가 깨달은 오도송을 여덟 번째인 ‘인우구망(人牛俱忘)’으로 선택했다.
‘십우도’는 ‘찾을 심(尋)’을 써서 ‘심우도’라고도 부르는데,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 ①심우(尋牛),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②견적(見跡), 드디어 소를 발견하는 ③견우(見牛), 소를 도망가지 못하게 고삐로 묶는 ④득우(得牛), 소가 잘 길들어 고삐도 채찍도 필요 없는 ⑤목우(牧牛), 목동이 소 등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⑥기우귀가(騎牛歸家)까지 소를 찾는 발심과 수행이 끝난다.
⑦망우존인(忘牛存人)은 집에 돌아온 목동이 이젠 안심이 되어 소에 대한 걱정을 잊고 홀로 누워 즐긴다.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의 세계는 사라지고 바라보는 주체만 남았다.
⑧인우구망(人牛俱忘)은 주관과 객관이 함께 사라져 하나로 합일된 깨달음의 세계이다. 3·4구에서 “붉게 타는 화롯불 속의 흰 눈처럼 번뇌가 없으니 이제야 조사의 깨달음에 이르네”라고 읊었다.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는 공의 세계를 깨달아 부처가 된 공왕불(空王佛)의 경지이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 망상이 사라졌다. 둥그런 일원상(一圓相)으로 표현했다. 보명(普明) 선사의 목우도(牧牛圖)는 ‘소도 목동도 둘 다 소멸하는[雙泯]’ 인우구망에서 최종 수행 단계가 끝난다.
⑨반본환원(返本還源)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시작한 본래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자연)으로 돌아왔다. ⑩입전수수(入廛垂手)는 많은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의 자비행을 실천한다. 마지막 깨달음의 완성 단계이다.
인간의 삶은 주관[六根, 감각 기관]과 객관[六境, 인식의 대상]을 통해 인식 작용이 이루어지고 실상과 진리에 대한 앎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인식 작용의 주체가 되는 감각 기관인 육근(六根)이 청정하면 바르게 볼 수 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뒤틀어지면 바르게 볼 수가 없어 고통에 빠진다. 또 바라보는 대상의 겉모습[相]에 집착하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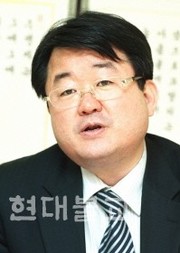
‘인우구망(人牛俱忘)’은 무아(無我)와 무경(無境)의 경지에서 자신도 소도 모두 잊고, 주체와 객체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 자유를 터득한 인경구탈(人境俱奪)의 경지이다.
그러나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신만고 끝에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대승 보살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