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편을 달리하니 三國이 三色이네
선(禪)의 본고장이자 발상지는 중국이다. 5가(家) 7종(宗)의 다양한 선풍을 비롯하여, ㆍㆍ 등 유명한 선어록과, 그리고 ‘무(無)’ ‘간시궐’ ‘마삼근’ 등 오늘날 우리가 참구하고 있는 화두도 모두가 중국에서 형성된 것이다. 선의 뿌리는 중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근현대 중국불교는 아쉽게도 신해혁명과 문화혁명(1966~1976) 등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인해 고풍 나는 가람은 홍위병들에 의해 90%가 파괴되고 지금은 200년 된 당우(堂宇)도 보기가 쉽지 않다. 사찰은 모두 그들이 점령하여 공장이나 제재소, 혹은 돼지 축사(畜舍) 등으로 사용했고, 스님들은 강제로 환속 당하거나 절에서 쫓겨났다. 문화혁명 기간 불교는 무위도식하는 무산계급(無産階級), 부르주아
윤창화 민족사대표2011-10-19 -

청규(淸規)의 역사와 그 의미
‘청규(淸規)’란 청정한 대중들이 모두 함께 준수해야 할 규칙ㆍ규율이라는 뜻이다. 곧 선종사원의 운영방침과 생활규칙, 그리고 규율 등을 제정한 정관(定款)으로서, 한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는 구성원이라면 상하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지켜야할 공통된 규약[共住規約]이다. 선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청규를 집대성해 총림 운영의 법전(法典)으로 성문화(成文化)한 이는 당(唐) 중기의 선승으로서 마조도일의 제자이자 황벽희운의 스승인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 선사이다.? 총림의 법전인 는 청규의 비조이다. 역사가들은 후대의 여러 청규와 구분하기 위하여 또는 라고 부른다. 중당(中唐) 정원(貞元) 연간(785-804), 대략 백장의 나이 70세를 전후한 시점에 성립되었을
윤창화 민족사대표2011-10-19 -

‘선의 황금시대’ 이끈 천재적 인물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명구로 유명한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 선사는 성당(盛唐)과 중당(中唐) 때 선승으로 최초의 선원총림인 백장총림(百丈叢林)을 창설했다. 선(禪)의 초조 보리달마 이후 선종사(禪宗史) 1600년 동안 뛰어난 선승도 매우 많지만, 백장회해의 업적을 평한다면 총림 규약인 ‘백장청규’ 제정과 ‘선종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제정과 선원의 독립은 중국 선불교 역사상 최대 사건이다. 보리달마가 처음으로 선을 전하고 육조혜능이 사상적 발전을 도모했다면, 백장회해의 역할은 총림의 법전(法典)격인 청규의 제정과 선원의 독립이었다.(백장 이전 선불교는 독립적 수행공간이 없었다. 선불교는 율종사원의 당우 한 채를 빌려서 수행하는 더부살이였다). 이
윤창화 민족사 대표2011-10-19 -

총림도 월별 계획표에 따라 움직인다
총림의 월별계획표를 청규에서는 ‘월분수지(月分須知)’라고 한다. 월분수지는 총림의 월중 행사로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할 정기적 사항이다. 월분수지는 1274년에 편찬된 ‘월분수지’와 1311년(원나라 초)에 편찬된 ‘월분표제(月分標題)’ 그리고 1338년(元 순제 원통4년)에 편찬된 ‘월분수지(月分須知)’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월분수지’의 내용은 당송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도 있고, 남송과 원나라 때 신설(新設)된 것도 있다. 예컨대 4월 13일 조에 “능엄회(楞嚴會)를 계건(啓建)한다” 또 11월 22일 조에 “제사기(帝師忌; 원나라의 초대 황제의 기일)” 같은 것은 각각 남송 때와 원대에 신설된 것이다. 해설이 필
윤창화 민족사대표2011-08-30 -

총림은 잠시 고요 속에 잠긴다
선원총림에는 1년에 두 번 결제와 해제가 있다. ‘결제(結制)’란 ‘안거제도를 묶는다’는 뜻으로, 석 달 동안 한 곳에 정주(定住)하면서 참선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해제(解制)’란 ‘안거제도를 푼다’는 뜻으로 운수 행각하는 기간을 말한다. 총림에서 여름 결제(하안거)는 음력 4월 15일~7월 14일이고, 겨울 결제(동안거)는 음력 10월 15일~다음 해 1월 14일이다. 결제가 끝나는 날부터 다음 결제가 시작되기 하루 전까지를 해제(解制), 또는 ‘해제기간(解制期間)’이라고 한다. 선승들은 해제가 되면 석 달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모두 운수(雲水) 행각(行脚)의 길에 오른다. ‘구름(雲)처럼, 흘러가는 물(水)처럼 걸어 다닌다’는 뜻으로, 인도에서는 ‘유행(遊行)’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도 유행 도중
윤창화 민족사 대표2011-08-30 -

당송시대 선원에서는 경전공부를 했다
1000년 전 당송시대 선원총림에서는 경전을 보았을까? 우리나라 전통 선원에서는 대부분 ‘불립문자’를 내세워 경전이나 책은 일체 보지 말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책은 독약”이라고 까지 매도한다. 혹독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선불교가 정점에 달했던 당송 시대에도 과연 오늘날 한국 선불교처럼 간경(看經: 경전 공부)을 독약으로 여겼던가? 송대(宋代) 초후기 무렵 장로 종색 선사가 편찬한 (1103년)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당송시대에도 선당(禪堂) 밖, 좌선시간과 맡은 소임 외에는 과 을 많이 보았던 것이다. 장로 종색의 4권 ‘장주(藏主)’ 장(章)에는 장주(藏主: 장경각 담당)의 임무와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주(藏主)는 금
윤창화 민족사 대표2011-08-30 -

제도할 수 없으면 추방한다
승가에서는 5계 가운데 살생(殺生), 투도(偸盜), 음행(淫行), 망어(妄語) 등 네 가지 계를 범했을 경우 대중공사를 붙여 추방한다. 이것을 율장에서는 ‘사바라이(四波羅夷)’라고 한다. ‘사바라이’란 ‘네 가지 중죄(重罪)’라는 뜻으로서 ‘사중죄(四重罪)’ 또는 ‘사중금계(四重禁戒, 네 가지 중요한 금기사항)’라고 하는데, 승가에서 가장 중시, 엄금하는 계율이다.?그 밖에 승단을 뒤흔들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즉 승가의 화합을 깬 경우에도 당사자가 참회, 개선하지 않으면 사바라이와 같이 중죄(重罪: 추방, 퇴출)로 다스린다.? 추방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도첩(度牒: 승려신분증)을 빼앗아 버린다고 하여 ‘체탈도첩(?奪度牒)’이라고 하고, 율장의 용어로는 ‘멸빈(滅?, 승적에서 이름을 멸살시키고 축출
윤창화2011-08-08 -
선원총림은 그 자체가 극락세계
선화(禪畵), 선미술 ‘선화(禪畵)’는 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미술적 기법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선미술(禪美術, Zen Art)’ ‘선종(禪宗) 미술’이라고도 한다. 선화는 선(禪)이 모태가 된다. 선화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선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선문답의 내용을 담은 공안화(公案畵), 보리달마 등 선승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 깨달음의 경지를 묘사한 것 등이 있다. 한편으로는 그 영역과 장르가 애매모호한 것이 또한 선화의 세계이다. 단정적으로 어떤 것을 ‘선화’라고 말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선(禪)과 관련된 것이라면 다 선화라고 할 수 있다. 화단에도 선화가 있지만 딱히 한 장르로 정착돼 있지는 않은 듯하다. 특히 요즘에는 그냥 묵(墨
윤창화 민족사대표2011-07-22 -

선시는 무아(無我)이어야 한다
선(禪)은 문학이 아니다. 선은 언어도단의 세계로 문자와는 먼 거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승들은 문인(文人)들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선시(禪詩), 선문학을 낳았다. 탈속 무애한 시적(詩的) 영감, 그것은 직관적 사유로부터 발아된다. 깨달음의 세계, 선(禪)의 세계에 대해 읊은 선승들의 게송(偈頌, 싯구)을 ‘선시(禪詩)’라고 한다. 선문학의 백미는 선시이다. 선시에는 깨달음의 순간을 노래한 오도송(悟道頌), 임종에 즈음해 읊은 열반송(涅槃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선미(禪味)를 느낄 때 읊은 시(詩), 선의 세계를 노래한 시(詩)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선시는 탈속함이 있어야 한다. 해탈한 선승의 입에서 나온 싯구가 그리움ㆍ이별ㆍ슬픔ㆍ고뇌 등 애잔한 감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거나, 중생적인 감성
윤창화 민족사 대표2011-07-05 -

화두는… ‘당근이지’
수행자로 하여금 번뇌 망상과 분별적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수단 혹은 교육용 방편을 ‘공안(公案)’ 또는 ‘화두(話頭)’라고 한다. 공안과 화두는 조실이나 방장 혹은 선사(禪師)가 수행자에게 던지는 ‘과제’ ‘관문’ ‘숙제’ 같은 것으로, 이 한마디에 심안(心眼)이 열린다면 불(佛)과 동격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참구해야할 과제가 된다. 그것이 곧 공안, 화두이다. ‘공안(公案)’이란 ‘공부(公府, 관청)의 안독(案牘, 공문서)’에서 ‘공(公)’과 ‘안(案)’만 따온 말로서, ‘헌법’ ‘법령’ ‘공문’ 등을 뜻하는 중국 당시의 행정 용어이다. 공무원들에게 국가에서 제정한 헌법이나 법령 또는 상부기관의 공문은 공무(公務) 수행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준칙(準則)·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2011-06-22 -

스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당대(唐代) 조사선의 선승들은 상당법어와 선문답 등 각종 법어를 통해 고준한 선어록을 남겼다. 마조도일, 백장회해, 조주종심, 운문문언, 임제의현 등 선승들의 법어는 정법의 눈(正法眼)을 열어주는 청량한 말씀으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선의 바다를 만들었다. 당대(唐代)의 선, 조사선은 곧 ‘공안 형성의 시대’ ‘선문답의 시대’였다. 반면 송대의 선은 당대 선승들이 남긴 선어록이나 선문답ㆍ공안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대, 해석, 주석하는 시대, 우려먹는 시대였다. 송대에는 유명한 공안이 별로 없다. 있어도 깨달음의 문을 여는 공안이 되지 못했다. 간화선의 시대에서도 전해지는 선문답은 모두 당대의 것이다. 선(禪)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선승과 선승, 또는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격외의 대화, 방외
윤창화 민족사 대표2011-06-17 -

망자나 생자 모두의 탐착심을 끊게 한다
? ‘총림(叢林)’이라는 말은 선종사원(禪宗寺院)을 지칭하는 말이다. ‘선림(禪林)’이라고도 하는데, 큰 규모의 총림은 보통 500명 이상 수행했으므로 열반(입적)하는 스님도 종종 있었을 것이다. 선승이 입적하면 모든 장송의식은 총림에서 치룬다. 장례의식의 정점은 다비(茶毘, 火葬)이다. 다비의식은 무상(無常)의 끝을 보여준다. 총림의 다비장(茶毘場)은 지정돼 있는데, 위치는 가람과 좀 떨어진 넓은 곳에 설치한다. 먼저 참나무 장작을 높이 쌓은 다음 망승(亡僧)의 시신이 들어 있는 감(龕, 棺)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다음 다시 장작을 높이 쌓아 올린다. 불길이 높이 올라가고 불꽃이 튀게 되므로 다비장이 넓어야 한다. 자칫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넓은 곳이 없을 경우는 ‘약식 다비’라
윤창화 민족사 대표2011-06-10 -

왕생정토 위해 향 사르고 합장
선승의 죽음을 높여서 ‘입적’ 혹은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입적(入寂)이나 열반(涅槃)은 ‘적멸(寂滅)’을 뜻하는 말로서, 번뇌가 소멸돼 마음이 고요ㆍ평온해진 상태를 말한다. 즉 탐욕, 증오, 어리석음 등 미혹함이 사라진 상태이다. ‘원적(圓寂, 완전한 적멸의 세계)’도 같은 말이다. 인간은 육체와 마음, 안이비설 등 감각적 기능을 갖고 있는 한, 욕망과 증오, 시기, 질투 등 중생적인 생각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죽는 날까지 항상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육체가 사라지면 존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후대에는 입적ㆍ열반을 죽음과 동의어로 쓰게 됐다. 선원총림에는 당송시대부터 병승(病僧)을 돌보는 소임과 당우가 있다. 그 당우를 연수당(延壽堂)ㆍ열반당(涅槃堂)ㆍ무상원(無常院
윤창화 민족사 대표2011-06-10 -

속(俗)을 버리고 열반으로 나아가다
사미계(沙彌戒, 사미니계)는 20세 미만의 행자가 받는 계이다. 불살생ㆍ불투도 등 모두 열 가지(10계)로 이것은 스님으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조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율장에 따르면 사미는 아직 정식적인 스님이 아니다. 정식 스님은 구비된 계율인 구족계(具足戒: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받아야 한다. 초기불교 당시 석존의 아들인 라훌라가 출가하자 어린 나이에 무려 250가지나 되는 계율을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열 가지만 뽑아서 제정한 것이 사미 10계이다. ‘사미’란 산스크리트어 스라마네라(?r?ma?era)의 음사어로서, 남자는 ‘사미(沙彌)’, 여자는 ‘사미니(沙彌尼)’라고 하고, 한역하면 ‘근책남(勤策男)’, ‘근책녀(勤策女)’라고 한다. ‘장래 비구, 비구니가 되기
윤창화 민족사대표2011-05-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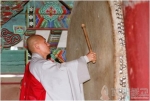
법종, 법고 모두 치면 대환영 뜻
? ? ? ? 선의 세계는 언어문자의 강 저편에 있다. 닿을 듯 그러나 어렵다. 그래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한다. 범종(梵鐘)이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
박기범 기자201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