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불성의 눈을 뜨고 살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의 하룻밤 주막(廬天地假形來)
얼마나 많은 생을 나고 죽고 했는가(慙愧多生托累胎)
겨울밤 고사목 부러뜨리는 흰 눈 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玉塵一聲開活眼)
깊고 밝은 달만 내 마음에 비치네(夜深明月照靈臺)
소요당(逍遙堂) 태능(太能, 1562~1649)선사는 전라도 담양 사람으로 백양사, 금산사, 연곡사에서 교화를 폈다. 당대 불가의 양대 산맥인 부휴(浮休) 대사에게서 경전을 배우고, 뒤에 묘향산에 찾아가 휴정(休靜) 대사에게서 참선 공부를 해서 선법을 계승했다.
부휴 대사는 승보사찰인 송광사를 중심으로 지리산의 맹주였고, 휴정 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나라를 구한 호국 대성사이다. 부휴 대사의 제자 3걸(충휘·응상·소요) 중에 한 분이며, 서산 대사의 문하 4대파(사명파·편양파·정관파·소요파) 중 하나인 소요파를 이룬 선교(禪敎)의 거장이다.
위의 오도송은 〈소요당집〉에 나오는 선시다. 〈소요당집〉은 그가 입적한 후 150년이 지나 편찬됐다. 서산 대사의 제자 가운데 특히 시문에 뛰어나 스승의 선시를 계승하여 자연을 노래한 그의 시가 일반 사대부에게도 회자돼 〈동문선〉에 수록됐다.
오도송의 주제는 인생의 무상함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노래한다. 불교 교리의 핵심인 무상·무아(공)·중도·연기·마음 등을 운율을 가미하여 게송으로 읊는 것이다. 소요 대사의 선시는 깨달음의 세계를 불교의 전문 용어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 체험을 사실적으로 자연에 비유하며 상징을 통해 표현해 문학성이 뛰어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사들의 선시(禪詩)는 불립문자인 깨달음의 경계를 시적인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시인은 시에 선적인 깊은 의미를 담아서 삶의 의미를 통찰해 시를 단장했다. 이렇게 선과 시가 상호 교류하고 만나 동방의 시문학사를 빛냈다.
소요 대사의 오도송은 전반부에서는 중생의 삶을 쉽고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후반부에서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은 광명의 세계를 설하고 있다. 1·2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의 하룻밤 주막, 얼마나 많은 생을 나고 죽고 했는가”라고 무상한 인생의 모습을 읊고 있다. 최희준 가수가 노래를 부른 ‘인생은 하숙집’ 가사와 같이 친근감이 있는 시구이다.
인생은 나그네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가 하룻밤 자고 떠나는 여관, 주막집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윤회를 되풀이하는 고륜중생(苦輪衆生)을 노래하고 있다.
3·4구는 “겨울밤 고사목 부러뜨리는 흰 눈 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 깊고 밝은 달만 내 마음에 비치네”라고 미몽의 잠에서 문득 깨어난 오도(悟道)의 세계를 읊고 있다. 지혜광명인 불성을 발견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나오면 둥근 달이 떠 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보배창고가 있다. 눈을 뜨면 바로 월광(月光) 심주(心珠)가 비춘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혜의 광명인 불성이 빛나고 있다. 소요 대사는 깊은 산사에서 밤새 내린 눈[백설]이 쌓여 그 무게로 천년 고사목이 부려지는 소리를 듣고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색성오도(色聲悟道)이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바라본다. 내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본래마음인 자성[불성]을 발견했다. 견성(見性) 성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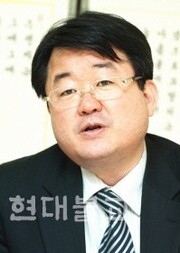
소요 대사의 오도송은 무상한 인생을 살면서 참된 불성의 눈을 뜨고 살라는 가르침이다. 무상한 인생을 살면서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까지 보태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허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