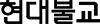50년 만에 간 중학교 동창회
외형에 내려앉은 세월 ‘실감’
다시 못 올 시간 그리움 담겨
졸업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중학교 동창회를 다녀왔다. 멀리 경주까지 KTX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한 고속열차가 동대구역을 지나 신경주역에 가까워지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향수가 한꺼번에 부풀어 올랐다. 이름도 얼굴도 가물가물한 중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같이 짝꿍을 했던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등등. 어느새 내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시내 외곽의 분황사를 지나 행사장인 ‘더 K 호텔’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언젠가 들어 본듯한 이름들을 불러대는 소리로 이미 왁자지껄 시끌벅적했다. 얼굴은 겨우 기억나는데 이름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동창들이 대부분이었다. 하긴 10년도 아닌 50년이란 긴 세월의 강을 건너 얼굴과 이름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 친구가 내 이름을 살갑게 부르면서 악수를 청했지만, 정말이지 나는 그 친구를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무안해했고, 나는 미안해서 당황했다.
그렇게들 한바탕 소란을 떨다가 가까운 테이블로 삼삼오오 끼리끼리 둘러앉았다. 근황을 주고받고 당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사이에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노래 부르는 남자 동창을 둘러싸고 여자 동창 서넛이 춤을 추면서 흥을 돋우기도 했다. 이쪽저쪽에서 건배사와 함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서울행 막차를 타기 위해서는 망설임 없이 곧장 일어서야 했다. 울산 사는 여자 동창이 가는 방향이라면서 태워주겠다고 말했다. 고마운 일이었다. 안전벨트를 채우는 동안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백발의 중년 아저씨와 아줌마는 동시에 멋쩍게 웃고 말았다.
문득 베이비붐 세대인 60대 중반의 내 나이 또래가 그나마 고향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대인 아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다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고향이란 관념이 아예 생겨날 틈도 없었을 터이다.
서울 토박이인 우리집 보살은 내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낼 낌새라도 보이면 못 들은 척 얼른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버린다. 자기로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기억과 추억담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 뻔하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뒤끝 작렬하는 혼·잣·말로 조용하게 읊조린다. 당신은 한여름밤 길게 드리워져 있던 은하수의 짙은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느냐고. 그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먼 그리움의 원천이 되는 이유를 알기나 하느냐고.

하지만 나의 애먼 넋두리는 거기까지가 전부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촌티 물씬 나는 중늙은이로 낙인찍힐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더 보탤 말도 더 뺄 말도 없다.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그날 경주 보문단지에는 ‘그리움’과 ‘기다림’이란 꽃말을 가진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중학교 동창회를 다녀온 주말 내내 나는 고향의 몸살을 심하게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