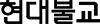광역버스서 광화문 풍경 보면
나라가 두 쪽 날까봐 두렵다
정녕 봄날은 저 멀리에 있는가
햇살은 곱고 바람은 살갑다. 덩달아 우리들의 가슴은 울렁거리고. 바야흐로 봄이 왔다는 소리다. 더 보탤 말도 더 뺄 말도 없다. 나에게 봄은 언제나 단문의 감탄사인 ‘좋다’였다.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군대나 갈 수밖에 없었던 1980년의 이른 봄 단 한 번만을 빼고는. 봄이어서 더없이 좋은 나날들이다.
일주일에 두어 번 광화문에서 타거나 내리는 광역버스를 이용한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여간 솔솔하지 않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옷차림에서 그날 날씨나 기분, 세상 돌아가는 낌새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가만히 웃음을 머금거나 얼굴을 조금 찡그려보기도 한다. 밤늦은 시각에는 헤어지기 싫은 젊은 연인 한 쌍이 차창을 사이에 두고 수화와 대화가 뒤섞인 작별의 말들을 쉼 없이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다. 나에게도 저런 청춘의 시간이 있었을 테지. 아쉽지만 광화문연가 속의 정겨운 풍경은 여기까지다.
작금의 서울 광화문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선고일을 앞두고 거의 날마다 야단법석과 아수라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순신 동상을 경계 삼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마치 남북 간의 이념대결이라도 벌이는 듯한 살벌한 모습들을 연출한다.
아는 사람 중에 경남 진주에서 올라오는 퇴직 교수 부부는 탄핵 반대파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서 서울 나들이를 하는 금슬 좋은 중년 부부는 탄핵 찬성파다. 비겁한 나는 양쪽의 입장을 똑같이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응원한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대단하시다고, 당신 같은 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다고, 그럴싸한 추임새도 넣으면서. 하지만 돌아서면 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이러다 나라가 정말 두 쪽이 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고 무섭기 조차하다.
엊그제의 일이다. 2년째 연재물을 기고하고 있는 교계 잡지사 편집실로 지방의 몇몇 독자들이 최근 대통령을 비판한 내 글을 문제 삼아 거친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는 전언을 들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런지 내심 당황스럽다. 다시 읽어봐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지만,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읽히는가 보다. 원고의 내용이라고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인 검찰과 특정 고등학교의 인맥을 너무 중시하는 듯한 인사 스타일을 공(公)적 윤리의 측면에서 약간 꼬집은 정도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령의 여진이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 싶다. 피붙이 가족 간에도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정녕 우리가 바라는 따뜻한 봄날은 저 멀리 있는 것일까. 봄날 저편의 광화문 풍경이 아직도 겨울인 것만 같아 씁쓸한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