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학습지만큼 싫었던 것이 사찰 가는 일
29살에 출가한 것도 어렸을 적 기억 작용해서
MZ세대가 사찰 오려면 ‘재밌는 불교’ 거듭나야
시대 맞춰 ‘재미의 옷’ 입고 어울림, 좋지 않은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수학 방문학습지를 구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숫자를 많이 싫어했던 이유로 매주 스무 장씩 숙제를 풀어놓으면 방문선생님이 오셔서 점검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던 그 학습지가 너무도 하기 싫었던 감정이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많이 밀리기 일쑤였고, 어느새부터인가 숙제를 하기 위한 노력보다 왜 숙제를 안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구상하는데 더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잔치에 가야한다는 둥 몸살이 났다는 둥 거짓말이 다 떨어지자 마지막에는 “다 풀어놓은 학습지가 어디로 갔는지 도통 모르겠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변명까지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넘어가시던 부모님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그 날은 정말 숙제를 안 했다는 사실을 실토할 때까지 저녁 식사를 거르면서 혼내셨고,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학습지를 열심히 잘 풀고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는 결말도 좋았겠지만, 학습지 구독을 끊는 것으로 부모님도 속이 편해지시고 저도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나쁘지 않은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에서 1등하는 네가 이 학습지 몇 장이 풀기 어려워서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하기 싫은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거짓말 늘어놓을 머리를 키우느니 공부 좀 덜해도 된다.”
학습지 구독을 끊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이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숙제하기 싫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에 숙제를 하는 편이 훨씬 시간과 노력 면에서 현명했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계간 경제학 저널(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게재한 그의 논문 ‘이성적 선택에서의 행동 양식(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에서 고전 경제학에서 정의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정이 필요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감정의 호불호는 어떠한가, 판단을 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용되는가에 따라 사람은 ‘최적의 대안’이 아닌 ‘적당히 만족스러운’ 해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사이먼의 이론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주변 환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보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협된 결정을 한다는 데 주안점을 주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마음의 호불호, 좋고 싫음이 아닐까 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널리 알려진 승찬 대사의 〈신심명〉은 위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지극한 깨달음의 시작과 끝이 오직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는 선사의 가르침은, 역으로 그만큼 우리 중생들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학습지만큼이나 어린 시절 하기 싫었던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부처님오신날 아버지를 따라 절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오신날만큼은 꼭 저를 데리고 인근의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귀한 휴일에 별 관심도 없던 절에 가서 절하고 채식으로만 나오는 비빔밥을 먹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또 절들은 다 산속에 있어서 땀나는 등산은 당연히 따라오는 옵션이었습니다. 불교가 나에게, 부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원하지 않는 어색한 곳에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에 싫은 감정만이 있었던 듯합니다. 만 29살이 되어서야 출가인연이 이어진 데에는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관계 맺는 방식이 크게 변한 세상, MZ세대니 알파세대니 하는 용어의 홍수 속에서 한국불교는 다시 오래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불자님들이 불교에 흥미를 느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절에 오게 할까.
지난 4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불교박람회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재밌는 불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불교박람회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디제잉하는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이었습니다. 진짜 스님은 아니지만 장삼을 입고 ‘카톡을 안 읽어서 고통, 친구가 잘 나가서 고통, 미래가 안 보여서 고통~’이라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뉴진 스님에게 많은 이들이 즐거워하고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교는 어렵고 따분하다는 통념을 벗어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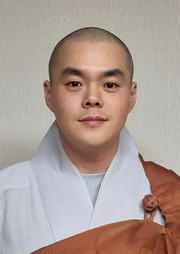
어느덧 오늘은 부처님 생신날입니다. 아이들이 스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절에 와서 즐겁게 웃으며, 비빔밥이 비건이라고 몸에 좋다며 잘 먹는 모습에 좀처럼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재미가 불교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시대에 따라 즐거움과 재미의 옷을 입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젊은 불자님의 밝은 얼굴 안에서 수학 학습지를 여전히 싫어하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절에 가던 어린 날의 제 얼굴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나날이 부처님오신날이고, 매일 매일이 절에 오는 날이기를 발원하겠습니다. 곳곳이 사바세계에 임한 극락세계이고, 모든 순간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부처님오신날을 빌려 축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