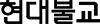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다. 소외되고 힘겨운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작은 온정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일지 모른다. 우리가 내미는 작은 정성은 때때로 고통보다 큰 희망이 돼 주고 그 희망은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가 된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 불자들은 법회 날이면 하던 일도 멈추고 법당으로 향한다. 손끝으로 펼쳐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한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비장애인인 우리가 더 깊은 수행과 실천을 다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오래전 그들을 만났을 때는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이들이 많았다. 육체적인 장애는 마음의 벽이 되기도 했고 세상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며 그들의 생각은 서서히 변화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자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이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민다. 도움만 받던 사람들이 기꺼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 변화는 그들 자신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됐다.
전철역에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는 시각장애인 불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광림사 법당까지 안내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있다. 서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끼며 부처님 앞에 다가서서 합장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진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헤맬 때 두 손을 잡아 길을 안내해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 법회를 마치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봉사를 하며 서로의 육체적 아픔을 달래 준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베푼다는 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만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남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마음 써야 할 일은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일이다. 그 친절함이 따뜻한 마음이 되어 전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가난한 이에게는 물질적 도움이,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는 자비심이, 진리를 찾는 이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가가는 것이 참된 나눔이 된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손길 하나면 충분하다.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웃었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 주었다. 부처님 앞에서 손을 모으며 우리는 말보다 깊은 마음의 언어로 ‘자비’를 배웠고 서로의 길을 밝혀 주는 ‘마음의 스승’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