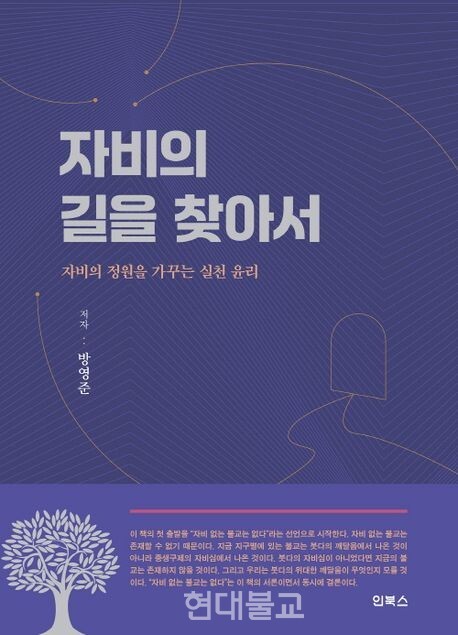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는 언제나 깨달음과 더불어 언급된다. 그러나 오늘날 자비는 종종 개인적 미덕의 차원에 그친다. 〈자비의 길을 찾아서〉는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 자비를 현대 사회의 ‘실천 윤리’로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자비를 연민이나 시혜적 사랑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초기불교의 사무량심(四無量心)과 무재칠시(無財七施)에서 출발하되, 연기(緣起)의 원리에 기초한 ‘상호윤리’의 개념으로 재정립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비를 ‘타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저자는 이러한 상호윤리의 개념을 통해 자비가 지향하는 보편 윤리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자비는 국경과 종교를 넘어서는 인류 공동의 윤리이며, 나아가 현 시대가 직면한 생태 위기와 사회적 분열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이 던지는 또 하나의 핵심 화두는 ‘깨달음과 자비의 관계’다. 전통적으로 깨달음은 수행의 궁극적 목표로, 자비는 그 결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 도식을 뒤집는다. 자비의 실천이 곧 깨달음의 과정이며, 자비를 행하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교 수행이 머리로 ‘깨닫는’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옮겨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깨달음 없는 자비는 방향을 잃고, 자비 없는 깨달음은 생명을 잃는다”는 저자는 자비를 ‘깨달음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의 길’로 제시한다.
‘깨달음의 종교’에서 ‘자비의 종교’로. 그 전환의 중심에는 바로 ‘상호윤리’의 실천이 있고, 한국불교의 미래는 그 자비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성신여대 교수를 정년 퇴임한 후 ‘행복하고 바른 사회’를 화두로 연구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