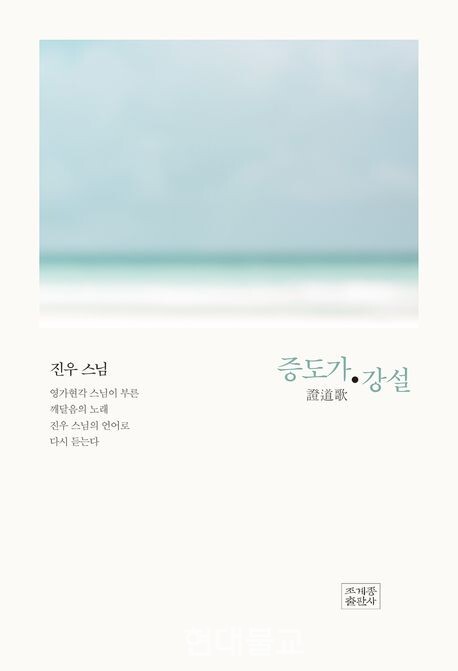영가 현각 스님의 선수행 요체
선적 상징·비유를 일상 언어로
삶의 구체적 장면 비유해 설명
고락·시비 넘어 마음 비추는 법

“다만 근본을 얻을 뿐 말단을 근심하지 말지니(但得本草愁末)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 달을 머금음과 같구나(如淨瑠璃含寶月).”
〈증도가(證道歌)〉는 중국 당나라 영가 현각(永嘉玄覺, 665~713) 스님이 선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을 집약해 남긴 선시(禪詩)다. 글자 그대로 스님이 직접 깨친[證道] 경지를 게송으로 노래[歌]했기에, 참선 수행자들에게는 ‘깨달음의 교과서’로 여겨진다. 그러나 짧고 압축된 게송은 선(禪)적 상징과 비유로 가득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은 “영가 스님이 〈증도가〉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실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수행을 통해 마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 해도 체득하기까지는 상당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스님이 〈증도가〉 강설에 나선 이유다.
그간 〈신심명〉과 〈금강경〉 등 불교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온 진우 스님은 〈증도가〉 강설 역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교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스님은 “깨달음은 특별한 곳이 아닌 지금 이 자리, 현재의 마음을 여여히 바라보는 데 있다”며 〈증도가〉에 담긴 지혜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 대입해 설명한다.
‘궁색한 불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음이라(窮釋子口稱貧 實是身貧道不貧)’는 게송을 풀이한 구절이 대표적이다. 진우 스님은 선물 받은 안경을 택시에 두고 내린 일화를 예로 들며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순간 아깝기도 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으나 곧 생각을 지워버렸다. 물건을 가지면 이내 집착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 가지거나 갖지 않는 두 가지 분별의 마음마저 사라져야 진정한 무소유요 가난하지 않음”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또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사업이 잘되거나 실패했을 때, 사랑과 이별을 경험했을 때 등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의 파도를 〈증도가〉의 지혜와 연결해 생각하게 한다.
핵심은 ‘좋다 싫다’ 하는 고락(苦樂)과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是非) 분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며 고락의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와 괴로움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화를 낸다면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다만 지혜가 부족하고 업(業)과 습(習)이 두터워 이를 조절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마음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매사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좋고 싫다는 분별된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일은 인과(因果)와 연기(緣起)에 따라 한 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전 해설자가 아니라 독자와 함께 걷는 ‘길동무’를 자처하는 스님의 글은 무겁지 않다. 깨달음의 노래를 오늘의 언어로 되살려 생활의 현장으로 가져온 〈증도가 강설〉은 우리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내 마음을 찾아서 지금 당장 편안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려 준다.
진우 스님은 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후 ‘선명상’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석과 콘텐츠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저서로 〈두려워하지 않는 힘〉, 〈제발, 걱정하지 마라〉, 〈만선동귀집 총송〉, 〈신심명 강설〉, 〈개미의 발소리〉, 〈진우 스님의 금강경 강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