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뇌 가득한 현실 품어 꽃길로 갚으리
‘보살행’ 김장하 선생 떠오르는 시
현실 번뇌·고통 꽃자리로 노래
‘번뇌가 보리’ 대승과 입장 같이해
현실을 파라다이스로 가꿔나가야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세상의 병든 이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김장하 선생의 말이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도 재상영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이지만, 한 어른이 우리 사회에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따뜻한 기운을 주고 있다. 특히 그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어려운 학창 시절 김 선생의 장학금을 받고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몇 해 전 김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일었다. 이런 이야기는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글을 쓸 때 가끔 소개하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특히 그렇게 많은 선행을 남들 모르게 했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김장하 선생의 짧고 굵은 한 마디를 통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했는지 알 수 있다.
“줬으면 그만이지!”
단순하면서도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핵심을 보여주는 멋진 말이다. 불교에서는 나눔을 실천할 때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상(相)을 내지 말라고 강조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공덕이 새어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장하 선생은 복이 새지 않는 무루복(無漏福)을 쌓은 무주상 보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상 시인의 ‘우음(偶吟) 2장’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문득 선생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는 시구에서 가시방석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를 꽃자리라 여기며 모든 것을 넉넉히 품는 모습이 마치 선생을 닮았다고 여긴 것 같다. 비록 고통과 번뇌, 망상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인의 지혜를 잠깐 빌리기로 하자.
구상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태어났다. 늦둥이로 세상에 나와서인지 ‘만득’이라는 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명심보감〉을 비롯한 〈동몽선습〉, 〈삼국지연의〉 등의 동양 고전을 배우면서 자랐다. 그는 15세에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 소신학교(小神學校)에 들어가지만, 중도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소신학교란 본격적인 사제 교육기관인 대신학교(大神學校)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곳이다. 그는 일본의 니혼대학 종교학과에서 공부했는데, 이때 대학에서 배운 불교는 그의 시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귀국 후에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시를 썼고, 6·25 전쟁 때는 종군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때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다. 둘은 격의 없이 술자리를 함께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5·16쿠데타 이후 정계 진출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사양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 비록 박정희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지만, 그는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작품을 썼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시집으로는 〈초토의 시〉를 비롯하여 〈까마귀〉, 〈개똥밭〉, 〈유치찬란〉, 〈조화 속에서〉 등 많은 작품이 있다. 금관문화훈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문학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한 편이다. 경북 칠곡에 그를 기리는 구상문학관이 있는데, 구상문학상 시상식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가 자주 참여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구자욱 선수는 구상 친형의 증손자다. 시인이 선수의 이름도 지어주었다고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우음(偶吟) 2장’은 구상 시집 〈조화 속에서〉에 실린 시이다. 우음이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읊은 시라는 뜻이다. 일종의 즉흥시인 셈이다.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1.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2.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번뇌가 보리의 현장
대학원 시절 존경하는 은사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시를 처음 접했다. 은사님은 참석한 제자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줬는데, 그 종이에 쓰인 것이 바로 이 시였다. 특별한 설명이 없었는데도 이 시를 소개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스스로 지은 감옥에서 벗어나야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이 바로 꽃길이니 용기 내어 잘 살라는 당부를 하시는 것 같았다. 오래전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때의 기억이 남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대체로 불교에서는 번뇌를 끊고 진리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행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번뇌, 망상을 소멸해야 비로소 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소승이라 불리는 부파불교에서는 ‘단혹증리(斷惑證理)’라는 말로 압축하였다. 이처럼 당연한 것을 대승에서는 부정한다. 번뇌는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리라는 것이다. ‘번뇌가 곧 보리(煩惱卽菩提)’인 셈이다. 왜 그럴까?
대승불교는 중생의 번뇌가 아니라 부처의 깨친 자리에서 설한다는 특징이 있다. 번뇌를 모두 끊고 깨침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깨친 자리에서 중생의 번뇌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번뇌가 곧 보리’라거나 ‘생사가 곧 열반(生死卽涅槃)’, ‘중생이 곧 부처’라는 입장도 이런 시선에서 나온 말이다. 번뇌와 생사, 중생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리, 열반, 부처와 하나인 자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다.
이러한 대승의 입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연꽃이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이란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꽃은 더럽다고 여기는 진흙밭에서 항상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 이 진흙이 바로 번뇌와 생사가 반복되는 중생의 세계다. 한마디로 연꽃이 서 있는 바탕은 번뇌 가득하고 시끌시끌한 시장이라는 뜻이다. 진리를 상징하는 연꽃과 세속을 상징하는 진흙이 결국 ‘한 몸(同體)’인 셈이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허공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하다고 세속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승과 맞지 않는다. 그들이 부파불교의 단혹증리(斷惑證理)를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구상 시인 역시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현실의 번뇌와 고통이 바로 꽃자리라고 노래하였다. 번뇌가 곧 보리라는 대승의 입장과 같이 하고 있다. 번뇌가 보리의 현장이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다름 아닌 꽃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현실이 지옥으로 느껴질 만큼 힘들더라도 이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때 유행했던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는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처럼 부조리하고 번뇌 가득한 현실을 온몸으로 포용하려 할 때 사회의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삶의 터전이니 말이다. 현실을 떠난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것이 눈뜬 선지식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파라다이스로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두에 소개한 문형배 재판관이 김장하 선생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사회에 있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사회에 갚아라.”
들을수록 감동적인 말이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맑히고 있다. 이런 어른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필자 역시 소리 없이 보살행을 실천한 한 어른에게서 오랜 기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덕분에 불교와의 인연도 깊어지고 불교 공부도 할 수 있었다. 김장하 선생이 최근 다시 주목받으면서, 작고하신 그 어른이 떠올랐다. 서랍을 뒤져보니 그분이 미국에서 보낸 편지 몇 장이 남아 있었다. 내게는 귀하디귀한 유산이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아 보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인들과 편지를 돌려 읽었다. 아마 그분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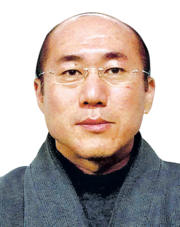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불교에 갚아라.’
꽃자리는 따로 있지 않다.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을 정토로 장엄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쉽고 의미 있게 전하는 일이 어쩌면 그분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