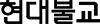황구지천을 따라 늘어선 벚꽃 길을 걷는다. 벚나무들의 표피 속으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얼마나 봄빛을 기다렸을까. 머지않아 일제히 꽃을 터뜨릴 것이다. 키 큰 벚나무 아래로는 앉은뱅이 풀들이 푸른 융단을 펼치고 있다. 냉이가 납작하게 엎드려 실뿌리의 강인함으로 풋풋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벚꽃 길이 끝나고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농부들이 논의 흙을 뒤엎었나 보다. 겨우 내 땅속에서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굳어있던 흙이 바깥세상으로 나왔다. 봄바람에 논흙이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벼를 수확할 때, 왜 벼 발목을 버려두는지 모르겠다. 흙 속에 묻혀 옴짝하지 못했던 발목 아래의 뿌리도 뒤엎은 흙을 따라 땅 위로 올라와 기지개를 편다. 누런 벼 뿌리대마다 푸릇푸릇 새싹이 올라오고 있다. 농부들은 머지않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새로운 모종으로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럴 줄 알면서도 묵은 벼 뿌리는 봄빛이 비치면 어디든 상관 않고 푸른 잎을 키워낸다.
들판을 구불구불 흘러가는 하천에 무리 지어 떠 있는 야생오리들을 바라본다. 물 위에서 꼼짝하지 않는 모습이 그동안 축축했던 깃털을 말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개천 옆 둔덕에서 몸을 말릴 것이지 왜 물에 떠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을까. 물가에서 버들강아지가 한창 눈을 틔우느라 분주해서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봄볕이 오리의 깃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흐르는 하천을 윤슬로 빛나게 한다. 그 물 위에서 반짝거리는 별꽃들 아래로 언뜻 오리의 붉은색 발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물 위로 둥둥 떠 있는 오리가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는 저렇게 쉼 없이 두 발로 헤엄치고 있을 줄이야.
이마를 간질이는 햇볕의 촉감이 부드럽다. 봄빛을 가득 품은 들판은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준다. 들판을 껑충 뛰어가는 고라니에게 안녕하고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한다. 누런 갈대가 긴 잎을 서걱거리며 대신 화답한다. 겨울바람에 살점이 뜯겨 나갔어도 땅속에 완강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갈대는 목은 쉬었지만 제소리를 내고 있다. 설령 온몸이 풍화되어 흩어진다 해도 그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갈대들 사이로 이팝나무 가지들이 나뒹굴고 있다. 겨울에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 따뜻한 빛이 비치고, 새들이 지져대도 그들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머지않아 쌀알 같은 꽃을 피워 봄을 환하게 밝힐 이팝나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은 저렇게 생명을 잃는구나. 우리 인간도 불법(佛法)에서 벗어나면 저 메마른 이팝나무 가지와 다를 바 없으리라.
3월의 봄은 분주하다. 봄빛은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수선화의 구근을 밀어 올리고, 진달래와 개나리의 꽃눈을 틔우고, 여린 쑥에게 씁쓰레한 향을 불어 넣어 노인들의 입맛을 돋우게 하느라 한 눈 팔 겨를이 없다.
봄빛은 쉬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빛을 받아야 꽃은 피어나고 송아지는 살이 오른다. 우리도 부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밀어 올려야 새사람이 될 것이다.
나, 봄빛 가득한 들판을 걸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