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정(避雨亭) 명상프로그램
‘내가 옳다’는 생각 괴로움 만들어
호흡 바라보며 숫자 세는 명상으로
마음 고르게 하며 자신 감정 통제
하수상한 시절엔 한겨울에도 장대비가 내린다. 한나절을 넘기는 소나기가 없건마는 낮밤 없이 장대비가 내린다. 그치질 않는 빗소리에 도통 잠을 이룰 수 없다. 대체 이 괴로움의 비는 어디에서 피할 수 있을까.
학생들과 매 수업 시작 전에 명상을 한다.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앉아 이마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신체 부위를 부르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조신(調身), 몸을 고르게 한다. 그 다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들숨, 날숨의 호흡을 바라보며 숫자를 센다. 조식(調息), 호흡을 고르게 한다. 다음으로 지금 당장 입가에 미소가 번질만한 행복한 순간과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조심(調心), 마음을 고르게 한다.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괴로움의 소나기를 피해 정자에 들어간다.
괴로움의 비를 피하는 정자이기에 이 명상 프로그램을 ‘피우정(避雨亭)’이라 이름 했다.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자극’을 통제할 순 없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나만의 해석, 나만의 신념체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반응은 이처럼 해석된 자극, 욕구와 신념체계로 해석된 결과물이다.
저기 앞뜰에 핀 꽃잎들이 나를 환하게 반기는 것은 꽃잎들을 환하게 해석한 내 마음의 결과물이다. 상서로운 눈구름과 불길한 눈구름은 우리 마음의 투영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본래 괴로움이 없건만, ‘내가 옳다·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 것이다. 어떤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계를 붙잡고 스스로 괴로워한 것이다. 이 괴로움은 결코 신의 뜻도, 전생의 업장도,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나와 연하여 함께 일어난 연기적 가합(假合)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피우정 프로그램에선 ‘고통’과 ‘괴로움’을 구분한다. 육체적 고통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정신적 괴로움인 번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제다. 어떤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보면 우리는 당장 ‘지금여기’라는 피안에 닿는다. ‘지금여기’에는 나라는 것도, 시간이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도 사라진다. 괴로움이 끼어들 조그만 틈도 없다.
피우정에선 특히 들숨날숨에 주목한다. 들숨날숨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역동하며, 불수의근(不隨意筋)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수면 중에도 활동하는 생리적 감각이며,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를 개입해 조절할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생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상대상으로 들숨날숨에 주의를 집중하며 ‘지금여기’를 체험한다. 그 마음을 들숨날숨에 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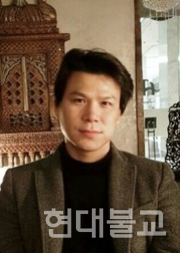
축구선수들은 공을 잘 다루기 위해, 발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차올리는 리프팅 연습을 반복한다. 그래 똑같이 발이 달렸어도 우리는 두세 번 만에 공이 제멋대로 날아가지만, 선수들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수백 개의 공을 차올릴 수 있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 발에 새로운 감각이 생겼기 때문이다. 명상의 감각도 이와 마찬가지다. 내가 왜 이 수행을 하는지, 이 수행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또 이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갖고 하는지 알고 실천하면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것이다. 평생을 하는 이 숨쉬기가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의 비를 피하는 들숨날숨의 정자가 되어, 비에 젖지 않고도 내리는 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