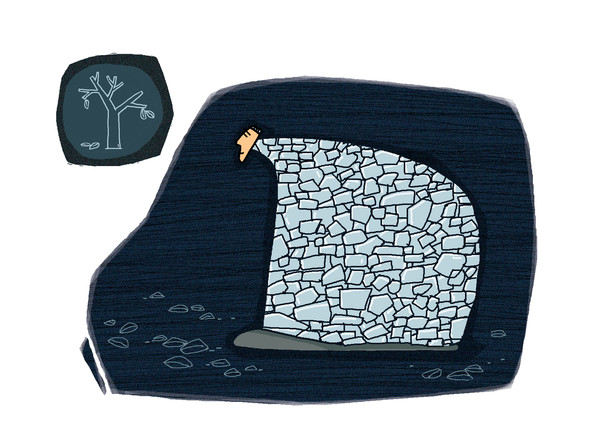
깊은 밤, 가로등이 흐릿한 불빛으로 떨고 있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낙엽들이 바람의 기척에 몸을 움칠거린다. 물기가 쏙 빠진 소금 알맹이들은 더는 썩지 않고 하얀 꽃을 피우는데 바싹 마른 낙엽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컴컴한 하수구 틈새로 곤두박질한다. 그만해도 다행이다. 도둑고양이가 먹이를 찾으러 낙엽 위를 살금살금 걸으면 핏기 빠진 낙엽은 그만 부서지고 만다.
낙엽이 밟혀 실핏줄이 터질 때 그 울음소리는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 생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도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지 못하면 불확실한 세상과 힘겨운 현실에 항복하고 마는 것인가.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생멸 이전으로 나아가는 유예 상태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단수이면서 복수인 낙엽들, 무수한 얼굴과 몸짓과 목소리가 하나로 합체되어 미완의 말줄임표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희미한 달빛마저 자취를 감춘 겨울밤이 허무한 멜랑꼴리로 깊어간다. 바람이 진눈깨비를 몰고 와 창유리를 흔든다. 진눈깨비는 자취를 감추고 물방울들이 유리창에 가는 선을 그으며 천천히 흘러내린다. 나는 손으로 유리창을 훔쳐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댄다. 입안에서 소금 맛이 살짝 나는 것 같다. 하얀 소금꽃이 축축한 겨울에도 피어나는 것인가.
책상의 앉은뱅이 달력에 붙어 있는 마지막 장이 엽록소를 잃은 누런 잎새처럼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것 같다. 한 해를 마감하는 며칠 남지 않은 날짜들은 회한과 안타까움으로 한숨짓고 있다. 세월이 몸피를 지닌 것도 아니고, 저 달력 속의 숫자들은 한낱 개념이 아닌가. 그런데도 나는 한 해의 끝에서는 떠도는 낙엽처럼 침울하다.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투명한 소금이 되고 싶은데,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으로 차가운 겨울밤에 덜덜 떨고 있다.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고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조금만 더 걸으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무엇이 그녀를 뒤돌아보게 했을까? 그녀는 믿음이 부족했다고? 아냐, 일상의 익숙한 삶이 그녀를 붙잡았을 것이다. 나보다 강한 능력을 지닌 신의 명령이나 사회적으로 조성된 과격한 제도를 뿌리치지 못한 연약함도 부끄럽다. 하지만 삶을 좀 먹는 것은 낡은 고정관념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따르는 안이한 행동, 아무런 성찰 없이 받아들이는 편협된 사고, 절제할 줄 모르는 감정, 여기에 게으름이나 나태함 같은 그릇된 습관 아닐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쌓여 안이한 삶이 되어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다.
어찌 소금 기둥도 소금 장미로 피어나고 싶지 않겠는가. 허무와 불안과 미혹으로 엉클어진 마음을 정화하는 순백의 소금 결정체가 되고 싶었다. 오만과 편견과 자랑이 난무하는 대화에 침묵으로 감칠맛을 드리우는 소금 알갱이가 되리라 다짐했다.
갑진년(甲辰年) 연말, 나는 안일한 매너리즘에 빠져 삶을 부식시키는 탐진치(貪瞋痴)를 빼내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 기둥으로 눈물 흘리고 있다. 소금 눈물이 흐를수록 갈증은 심해진다. 고요한 정적 속에 가부좌로 앉아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