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번뇌가 있으리오
깨달음은 본래 형상이 있는 보리수와 같은 것이 아니며(菩提本無樹)
밝은 마음 또한 거울경대(鏡臺)와 같은 모양이 없네.(明鏡亦無臺)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佛性常淸淨)
어디에 번뇌가 있으리오.(何處有塵埃)
〈돈황본 육조 법보단경〉
혜능(慧能, 638~713) 대사는 당나라 사람으로 선종의 제6조 조사다. 그의 문하에 남악 회양, 청원 행사, 남양 혜충, 영가 현각, 하택 신회 등 기라성 같은 제자가 나타나 중국 선불교의 황금시대를 주도하였다.
선종은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경전불교를 거부하고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주창한다. 당시 금보다 귀하여 구하기 어려운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명상, 알아차림)을 통하여 자기의 본래마음인 불성을 찾아 스스로 부처가 되자는 새롭게 일어난 실천불교 운동이다.
혜능 대사의 설법집인 〈육조 법보단경〉은 선종의 소의경전이다. 제자인 법해 스님이 모아서 기록하여 편찬한 선사어록이다. 혜능 대사의 설법 내용이 부처님 말씀처럼 훌륭하다고 하여 ‘경(經)’이라 존숭하였다.
혜능 대사의 오도송은 신수 대사와 함께 견성오도를 읊은 오도송의 시초로 〈육조 법보단경〉에서 전하는 드라마틱하고 전설적인 게송이다. 1·2구 “깨달음은 본래 형상이 있는 보리수와 같은 것이 아니며, 밝은 마음(거울) 또한 경대(鏡臺)와 같은 모양이 없네”는 〈반야경〉의 무아(無我) 공(空) 사상을 표현하였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실체가 없는 허망한 현상체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형상이 있는 사물이 아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보리수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마음 역시 실체가 없으므로 경대에 비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깨달음도 마음도 형상이 없는 무상(無相)이며 공(空)이다.
3·4구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티끌(번뇌)이 있으리오”는 불성이 본래가 청정하고, 더구나 무명번뇌는 실체가 없는 환상(幻相)과 같이 공(空)한 것이므로, 우리의 본래마음은 티끌번뇌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마음의 본래자리를 읊은 것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인 불성(자성, 본래심)은 항상 공적(空寂)하고 청정해 번뇌의 티끌이 낄 수가 없다. 번뇌는 본래 그 실체가 없다. 홀연히 텅 빈 하늘에 먹구름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이 불면 곧장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번뇌는 내 마음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객진번뇌(客塵煩惱)라 하고, 본래 없는 본무번뇌(本無煩惱)라고 한다.
1922년에 발견된 돈황본 〈육조법보단경〉(당나라 때 필사본 편찬) 이후(송원시대)에 편찬된 △혜흔본 △흥성사본 △대승사본 △설숭본 △덕이본 △종보본에서는 혜능 대사의 오도송 3구인 ‘불성상청정(佛性常淸淨)’이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로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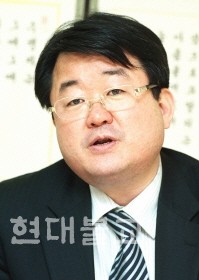
달마 대사가 2조 혜가에게 전승한 〈능가경〉의 교리가 복잡한 불성사상이 5조 홍인 대사에 와서 만민이 평등한 존재임을 밝힌 무아(無我) 공사상이 나타난 〈금강경〉이 혜능에게 전승되었다.
작금에 우리 교단에 선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5분 선명상을 통해 본래의 자기 마음을 찾아 하루 5분이라도 부처가 되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