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업 멈추고 선업을 지으십시오
초기경전에 담긴 부처님 법문들
‘선업 지어라’는 가르침을 담아
선업 앞서 악업 멈추는 일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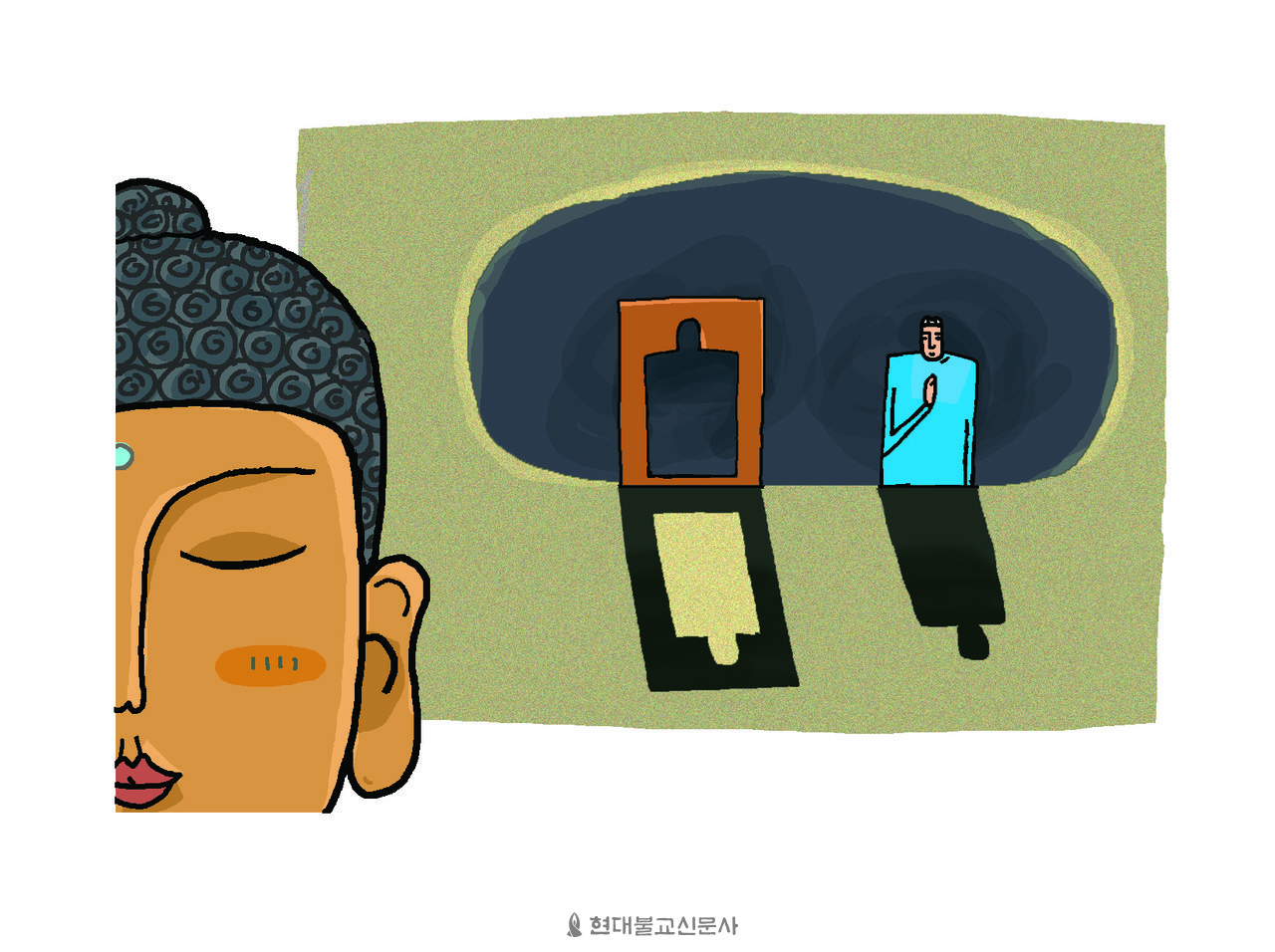
붓다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
“그 소식 들었어? 붓다가 우리 동네 오셨대!”
“저기 좀 봐! 왔어, 왔어.”
“아, 저기 저분이 그 붓다라는 분이야?”
꼬살라국의 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들뜬 분위기가 퍼져갑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훌륭한 붓다라는 분, 세상의 존경과 공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응공, 아라한)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가 보자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아쉽던 그 시절에 무슨 심오한 이치를 듣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토록 유명하다고 하니 얼굴이나 한 번 보자’는 궁금증이 더 컸을 것입니다. 붓다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경전에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께 합장하여 인사드리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한 뒤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말없이 한 곁에 앉았다.”(대림 스님 옮김, 〈맛지마 니까야〉 ‘살라의 바라문들 경’)
참 편안하고 자유로운 모습들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붓다를 향한 무게는 다릅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만큼의 인사를 하고서 편한 자리를 찾아 앉은 것이지요. 지극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는 절을 올릴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예를 갖춰 장황하게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어떤 이들은 딱히 붓다에 대해 믿음이나 존경심이 생겨나지 않았으니 제 이름만 말하고 혹은 아무 소리 없이 어디 빈 자리를 찾아가 앉습니다.
“절을 세 번 하셔야 합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지 않으면 그게 어디 절이라 할 수 있습니까?”
“법당 가운데는 비워두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예법은 아직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지 않았던, 그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 첫 만남의 풍경입니다.
붓다에게 행복을 묻다
우루루 몰려가서 나름대로의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자리를 잡고 앉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차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설법은 일방적인 법문이기보다는 제자나 신자가 궁금증을 털어놓고 그에 대해 부처님이 대답하고, 되묻고 다시 대답하고 하는 식의 문답이라고 말이지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는 죽어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죽어서 천상에 가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윤회를 믿고 있는 인도이니 이런 궁금증을 품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지옥은 괴로운 곳이고 천상은 즐거운 곳입니다. 지옥은 행복하지 않고 힘들기만 한 곳이고, 천상은 행복하고 힘이 들지 않고 편안하고 유쾌하며 그 즐거움이 오래 가는 곳입니다. 이 질문은, 죽은 다음에도 괴롭고 힘든 또 다른 생이 이어지는 건 무엇 때문이고, 죽은 다음에 즐겁고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죽어서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누군가는 “아니, 아직도 지옥이니 천상이니 하는 소리를 하시오? 가보기나 했소? 불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지옥, 천상 같은 미신을 들먹이는 거요”라고 불만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경전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읽고 음미하지 않으면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이 살아 있던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과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전에 수도 없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런 건 불교 아니다”라며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으니, 참 난감합니다.
종교문헌을 읽는 데는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끌어내는 방식이 있지요. 지옥을 괴롭고 처참한 나락의 경지로, 천상을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경지로 풀어보면 조금 와닿을까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지요. 죽음 이후의 일을 묻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을 원인으로 지옥에 가고, 법을 따른 올바른 행실을 원인으로 천상에 태어납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이란 악업을 말하고, 법을 따른 올바른 행실은 선업을 말합니다.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또다시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고작 악업 짓지 말고 선업 지으라는 거요?”
실제로 강의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업’을 이야기할 때면 ‘고작 업 이야기’라며 냉소를 보내는 수강생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 아실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살아 계시던 시절, 출가한 스님이 아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재가자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지으라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재가자 가운데도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에게는 차원 높은 법문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루틴을 되풀이하며 지내고 그런데도 늘 가난과 불행에 쫓기고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에 더 노출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할 때면 그 법문의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지으십시오!”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자꾸 ‘고작 업이야기’라며 싱겁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생에 지은 죄라는 둥, 평생 내려놓지 못하고 짊어지고 안고 가야 할 그 무엇이라는 둥의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서 벗어나려면…
초기경전에서는 업에 대한 법문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법문이 “당신이 전생에 무슨 짓을 해서 금생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식의 전생담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확히 무엇이 악업이고 무엇이 선업인지를 부처님은 짚어줍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행동, 말로 짓는 네 가지 행동, 뜻으로 짓는 세 가지 행동입니다. 모두 합해서 열 가지 업인데 이 열 가지 업(십업)에는 똑같이 악업(십악업)과 선업(십선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업을 짓는 것에 선행해야 할 것이 악업을 멈추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선업 보다 악업에 대한 설명이 늘 앞섭니다.
그 시절, 부처님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여쭈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이 열 가지 업에 대해 숙지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 가지 행동강령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어서 체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봐야 할 행동강령입니다.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 행동을 멈추고, 멈추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나와 이웃과 세상에 펼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난하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라고 탄식하기 보다는 지금 나의 어떤 행동과 생각이 가난을 불러들이는지를 현실적으로 잘 헤아려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불행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가난의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지요. 초기경전에서 수없이 펼쳐지는 업의 가르침은 이런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