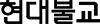37. 보석을 찾는 이 2
그럼 망가진 만다라를 손볼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그가 보고는 그냥은 쓰지 못하겠으니 틀은 그대로 쓰고 비단을 다시 입혀 그려야 하겠다고 하드라오. 그래 실력을 한 번 보여 달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더라오. 그날로 그에게 새 만다라를 맡겼다고 하오. 그와 똑같은 만다라를 그려 달라고 했던 거요. 금줄을 치고 금토를 뿌리고 그는 홀로 그 속에서 만다라만 그렸는데 내가 갔을 땐 이미 그 한국 젊은이는 없었소.
-그럼 젊은이가 가져갔다는 말인가요?
심 작가가 물었다.
-그건 모르겠소. 그와 똑같은 만다라를 그려달라고 해 금줄이 쳐진 그 속에서 젊은이 혼자 해체 작업을 했다고 하니 말이오.
이석원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다. 물론 밖으로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젊은이. 그리고 금어. 그럼 누구인가? 스리나가르로 난타의 검을 찾아 떠난 이석원이 아니고 누구인가? 믿지 못할 사실 앞에 나는 입을 벌리고 벌벌 떨었다. 그럼 그가 정말 그 검의 주인인 난타란 말인가? 그런데 이상하다? 이 늙은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었단 말인가? 나는 눈을 뜨고 늙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장께서는 어떻게 만다라 속에 성물이 있다는 걸 아셨는지?
서툰 내 물음을 알아들었는지 늙은이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조실이 죽기 이틀 전이었소.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조실이 만다라 속에 성물을 숨기고 있지 않겠소. 그래 내가 편지로 그 말을 했더니 당장 답장이 왔어요. 참으로 신묘하다고. 그러고 나서 며칠 못가 죽었으니.
-그럼 그 젊은 금어의 이름이 뭐라 하던가요? 만다라를 맡길 정도라면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름은 이곳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 했소. 아디카야.
-아디카야? 그럼 그 칼?
-그렇소. 이상하게 성물 이름을 쓰고 있었다고 했소.
-그럼 그 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군요.
늙은이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어떻게 찾을 수 있겠소. 이곳저곳 찾아다녀 보았으나 허사였소.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보냈소만, 모르지요. 정말 그 사람이 임자인지도…. 누군가에게 들으니 그를 뉴델리 마하르토 사원에서 보았다고 합디다.
-마하르토
오오스마가 짧게 되뇌었다.
-마하르토가 어딥니까?
내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뉴델리에 있는 사원입니다. 취재차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석원을 생각했다.
그를 마하르토 사원에서 보았다고? 한국 절에서? 십중팔구 낭설일 터인데….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여기 있었군 1
역전으로 나와 넷이 서성거렸다. 하나 같이 맥이 풀린 모습이었다. 왈리 슈트라 쉼라가 성물을 맡겼다는 사원으로 가 속 시원히 한 번 조사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제 와 뭐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곳까지 가느냐는 말에 하나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갑시다. 정 뭐하면 이석원이 와 있었다는 곳이나 가보지요. 꿩 아니면 매라고 잡아야지요.
-그럽시다. 제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금어승의 고뇌 어쩌고 하면 또 모르지요. 대박 터질지도….
뉴델리에 떨어지자 갑자기 송 서화가가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를 잡았다.
-모르겠소. 갑자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송 서화가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찰하고 난 의사가 말했다.
-급성 장염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지어주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멀쩡했다.
-괜찮습니까?
-어쩐 일인가 했습니다. 어찌나 장이 민감한지 물만 갈아먹어도 배탈이 나는데 기어이 용심을 부리네요. 이곳 의술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허허….
넷이 병원을 나오며 이석원의 뒤나 캐보자는 말을 나누었다. 뉴델리 마하르토 사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절 이름은 이곳 말을 땄지만 가보니 한국 절이 맞았다. 한국에 본원이 있는 말사라 철저히 한국식으로 지어진 절이었다. 행락철인데도 워낙 날이 더워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일주문을 들어서자 사천왕상이 우리들의 방문을 반겼다. 우선 원주스님을 찾았다. 객을 맞는 지객스님이 우리를 원주스님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제 오십이 갓 넘었을 동안의 원주스님이 우리를 맞았다. 그는 우리를 살피다가 무슨 일이냐고 하였다. 내가 기자 신분증을 내보였다. 오오스마 기자가 이석원에 관해서 물으며 그동안 심 작가가 입수했다는 사진을 내보였다. 원주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이곳 출신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안 금어의 아들이며 제자지요?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천추사원의 지안 금어가 살았을 때 불화 한 점을 여기서 그리게 했는데 얼마 전에 불쑥 나타났어요. 어찌나 꼴이 험한지 처음엔 비렁뱅이인 줄 알았지요.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터라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림 솜씨가 기가 막히더구먼요. 도저히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 만다라 보수를 맡겨 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먹을 것을 내주고 방도 내어주었는데 어느 날 쌀 한 포대가 없어졌더란다. 며칠 후에 또 몇 포대가. 그래 스님이 숨어 지켜보았더니 쌀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였다.
왜 쌀 도둑질을 했느냐고 했더니 그 쌀을 없는 사람들에게 져다 주었다고 했다. 그럼 달라고 하지 왜 도둑질하느냐고 했더니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 했다. 달라고 했으면 주었겠느냐는 것이다. 그건 그랬다. 그것도 시주받은 것이라 사내 스님들의 양식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신도들을 따라 시장에 간다기에 양 몇 마리를 사 오라고 돈을 주었더니 며칠 동안 오지 않았다. 돌아왔는데 보니 빈손이었다. 조실스님이 물었다. 양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헤헤 웃었다.
-그 돈으로 거지들 밥 좀 먹였지요.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그 돈을 없는 이들의 양식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고 술에 취해 돌아온 것이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스님에게 이곳의 사원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도저히 제 아비를 죽이고 쫓기는 사람 같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이곳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 다니는 줄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했더니 웃기만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연히 부처를 섬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여 공양해야 한다고 충고하더란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린 탱화를 손으로 가리켰다. 실천이 없는 곳에 저 탱화가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그는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그날 밤이었다. 사원 안이 왁자지껄하여 달려가 보았더니 거기 그가 있었다. 칼과 망치를 들고 그는 자신이 그린 성화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뒤늦게야 스님들이 달려들었다. 그러자 그는 찢어진 부처의 목을 밟고 길길 거렸다.
-이상하군요? 왜 자신이 그린 성화를 찢어 버린 것인지…?
오오스마 기자가 듣고 있다가 물었다.
원주스님이 고개를 내저었다.
-글쎄요. 금어가 부처의 얼굴을 찢을 때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오스마 기자가 이해가 잘되지 않는지 되물었다.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겠지요.
-그렇다고 이미 모셔진 탱화를 칼로 찢는다는 건 좀….
내가 이번에는 물었다.
-정신이 좀 돈 것 같드먼요. 사원마다 다니며 그랬다니.
-제 아버지를 죽이고 사원마다 돌아다니며 아버지와 자신이 그린 탱화를 찢고 있다?
심 작가가 생각에 잠긴 채 중얼거리듯 물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땐 그가 살인자인 줄 몰랐을 때인데 아무튼 말들이 많았지요. 그의 행위가 없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원의 폐쇄성 때문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림이 절대의 세계를 획득하지 못했기에 칼질해 버린 것이냐 그렇게 말입니다.
나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오오스마 기자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다면, 이석원이란 사람의 거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원주스님이 머리를 내저었다.
-알 수 없습니다. 떠도는 자의 거처를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일전에 말을 들으니 뉴델리역 부근에서 비렁뱅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아아, 참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구먼요. 지안 금어가 이곳에 있을 때 모 절로부터 탱화 몇 점을 그려준 답례로 받은 돈으로 허름한 집을 하나 얻은 모양입니다. 지안 금어는 그 집을 아들 이석원의 이름으로 얻었다고 합디다. 자주 한국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 셋집이 필요했던 거지요. 이석원이 주로 그 셋집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들어와 세를 빼려 한다는 말이 있습디다.
-그 집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글쎄요? 그놈 여기 있을 때 집을 빼야겠다며 서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 주소가 어디 있을 겝니다.
-그래요?
원주스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찾기가 힘들었는지 한참 있다가 나왔다. 그는 주소가 적힌 듯한 종이쪽지를 오오스마 기자를 향해 내밀었다.
-이것이 집 주소이긴 한데, 아마 맞을 겝니다. 우선 그곳에라도 가면 뭐가 나올지….
원주스님은 말을 남긴 뒤 머리를 조아리고는 말없이 돌아섰다. 원주스님이 준 종이를 내려다보던 오오스마 기자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아디카야?
잠시 종이의 글을 읽던 그가 뇌까렸다. 내가 왜 그러느냐는 듯이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주소 아래 이석원의 이름이 있고 그 옆에 괄호를 하고 아디카야라고 쓰여 있었다.
-아니 이거 왈리 슈트라 노인장을 만났을 때 성물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고 하던 그 그림쟁이 이름 아닙니까?
오오스마 기자가 비로소 생각난 듯이 소리쳤다.
심 작가가 오오스마 기자의 손에서 종이를 뺏어 보았다.〈계속〉
▶한줄 요약
아디카야의 검을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 이 기자 일행은 이석원의 행방을 쫒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