禪·생태주의, 詩語로 녹여내다
문학, 실천 통해 불교 내보인 美시인
한시, 하이쿠 접하면서 불교에 매료
20대 日교토 사찰서 참선 수행하기도
‘쇄석’, 스나이더 시론 방증하는 화두
선불교 직관적 표현방식, 시에 투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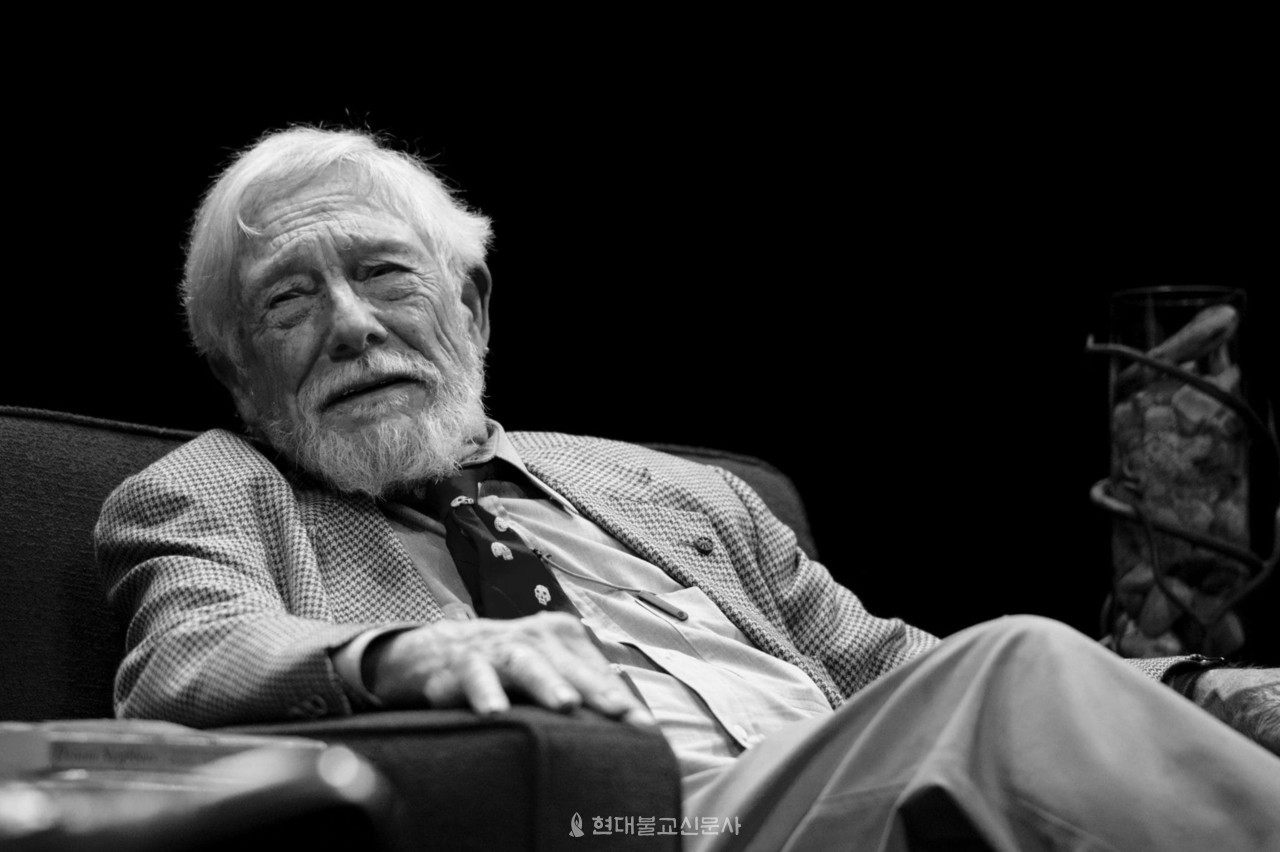
서구 문인들 중에서 동양의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 미국 시인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1930~, 사진)만큼 그 관심이 실제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났던 이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리 스나이더는 1930년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 면한 캘리포니아주 샌 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곧 보다 더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와 오레곤주로 계속 옮겨 다님으로 그도 젊은 시절을 그런 지역으로 가족을 따라 함께 옮겨 다니게 되었다. 그는 그러한 미국 북서부 지역의 험난한 자연환경과 접하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적응 매료되어 갔다. 고등학생 시절 그는 그 지역 한 등산클럽에 가입함으로써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의 설봉들을 오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그의 등산 경력은 평생 동안 이어졌다.
또한 그가 1947년 오레곤주 포트랜드에 있는 리드 대학(Reed College)에서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중국의 한시(漢詩)와 일본의 하이쿠(俳句) 그리고 불교와 같은 동양문화에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동양문화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접촉과 관심은 그 후로도 꾸준히 이어졌는데, 그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대학 대학원에서 동아시아학 연구를 통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도 그러한 그의 관심의 발로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그 시절 그는 중국 당대(唐代)의 시인 한산(寒山)의 시를 번역하기도 했고, 1950년대 미국 비트 세대의 대표자들인 잭 케루악(Jack Kerouac)과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등을 만나 그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1956년 그는 결국 화물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의 선불교 사원 쇼코쿠사(相國寺)에서 생활하며 미우라 이슈의 지도 아래 참선수련을 수행한다. 하지만 당시 아직 20대 중반의 팔팔한 젊은 청년이었던 그가 참선수련에만 빠져 있기에는 그의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를 주체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스나이더는 그 해 일본 등반가들과 어울려 일본의 북부 산맥들을 등반하기도 하고, 다음 해엔 요코하마에서 한 상선에 승선, 기관실 엔진 청소부로 일하면서 페르시아만을 거쳐 이태리, 시실리, 터키, 오키나와, 괌, 실론, 사모아, 하와이 등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1958년 4월 상 페드로에서 하선(下船), 결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그는 1959년 다시 일본 교토로 되돌아가 다이토쿠사(大德寺)의 승원에서 오다 세소의 지도 아래 참선수련에 다시 몰입한다. 그러면서 그 해에 그의 처녀 시집 〈쇄석(Riprap)〉을 교토에서 출간하고, 이어서 다음해에도 시집 〈신화와 텍스트(Myths and Texts)〉를 출간한다. 1961~1962년 사이 그의 자연과 불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돼 인도로 가는 보트 여행에 나서서 스리랑카와 인도, 네팔, 티베트 등지까지 여행하면서 달라이 라마를 예방하기도 한다.
그 후에도 그는 주로 미국 서해안 지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한때 잠시 모교인 버클리 대학에서 영시를 강의하며 시작(詩作)을 계속하기도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 수행과 등산여행을 병행했다.
1964년에는 시에라 산맥 북부 설빙지역을 배낭여행하고, 1967년에는 다시 다이토쿠사에서 참선수련에 몰입한다. 그는 일본 시인 나나오 사카키의 안내로 규슈 서해안의 작은 섬 수와노세에서 자연친화적 공동체 생활에 합류하고, 1969년에는 미국 전역의 환경 운동가들을 방문하며 생태운동에 헌신하기도 한다. 이때 샌프란시스코의 야생생태학회에서 〈곰 스모키 경전(Smokey the Bear Sutra)〉을 배포하여 현대문명의 반자연적·반생태적 양상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 경전은 오래 전부터 곰의 모습으로 현현해오던 부처의 말씀을 통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
1970년 스나이더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발치에 있는 상 후앙 리지(San Juan Ridge)에 직접 집을 지어 정착했고, 그 해 시집 〈파도를 바라보며(Looking at the Waves)〉를 출간한다. 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추진한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모색과 실천, 1972년에 행한 일본 홋카이도의 야생생태 탐사작업, 1974년 시집 〈거북섬(Turtle Island)〉 발간, 1975년 시집 〈거북섬〉으로 퓰리처상 수상, 1980년대의 중국 방문, 1990년대의 라다크 마을 여행과 동굴벽화 연구 등 그의 활동은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끊임없이 탐사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능한 방식을 모색하는 일에 연관되고 있다.
미국 문인 가운데서도 스나이더의 이러한 독특한 인생행로는 시인으로서의 그의 시의 방향과 특징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그의 시의 방향과 특징은 그가 삼림 감시원이나 산악 가이드 등을 통해서 얻은 실제적인 경험과 동양사상, 특히 선불교적 명상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일본에서의 오랜 체류 기간을 통해서 얻은 선불교에 대한 실천적, 이론적 공부를 통해서 자연과 문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현대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더욱 진지하게 정립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생태주의는 선불교 사상이 토대가 되었고,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또한 그의 작품이 이루는 시형식은 중국의 한시와 일본의 하이쿠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상적으로도 동양의 선불교 가르침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시에 나타난 이러한 이국적인 요소들은 그의 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미국 문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스나이더는 그의 생태주의와 선불교 사상을 결합해서 다양한 시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진정한 전이의 시로서 동양과 서양의 가장 유익한 예술과 철학을 흡수하고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이러한 방식은 후세의 시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이미지 중에서 그의 시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쇄석’(碎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쇄석’은 산에서 말이 다니기에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미끄러운 바위 위에 놓는 자갈을 가르킨다. 그의 처녀 시집의 제목이 〈쇄석(Riprap)〉이며, 그 시집에 담긴 시들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거친 삼림지대를 소재로 하면서, 그 표현방식은 선불교의 직관적인 표현과 깨달음을 위한 수련방식을 사용한다.
그는 시를 정의하면서 쇄석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는 형이상학의 미끄러운 바위 위에 놓이는 쇄석”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그는 바위를 부수어서 쇄석을 만들어 미끄러운 산길을 가는 말을 도와주듯이 시를 통해서 생태주의와 선불교 사상이란 추상적인 관념을 시의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의 독자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Lay down these words
Before your mind like rocks.
Placed solid, by hands
In choice of place, set
Before the body of the mind
in space and time:
Solidity of bark, leaf, or wall
riprap of things: (No Nature 43)
너의 마음 앞에 놓여있는
이 말들을 돌처럼 깔아라.
단단하게, 손으로
잘 고른 장소에,
공간과 시간 속
마음의 몸 앞에 놓아라.
단단한 나무껍질, 잎, 혹은 벽
사물의 쇄석: (No Nature 43)
이 시의 시작되는 두 행은 아마도 시인 자신이 시를 쓰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음은 결코 말로 쉽게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하는데, 이는 진정한 마음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므로 따로 문자를 세워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입장은 선불교적 깨달음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시인의 존재의미는 언어를 통한 사상과 감정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나이더는 마음 앞의 말들을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쇄석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의무로서 시를 쓴다. 마음의 몸 앞에 그것을 놓으라는 계속되는 요구는 시가 마음을 표현하는 몸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시는 나무껍질처럼, 나뭇잎처럼, 벽처럼 단단하고 구체적이어서 사물들의 쇄석의 역할을 한다.
스나이더는 생태주의 활동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의한 자연 파괴의 위험을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취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로 표현하게 되었다. 또한 그의 선불교 수련과 활동은 추상적인 사상이나 논리적 사고방식을 불신함으로써 이를 더욱 압축적이고 비논리적인 또는 논리를 초월한 시학이론을 펼쳤던 것이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표현방식은 선불교에서 공안(公案), 고칙(古則), 화두(話頭)라고 하는 것으로서, 참선 수행자가 궁구하는 문제를 뜻한다. 선불교인들은 공안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깨달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리하여 스나이더는 생태주의와 선불교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의 깨달음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물인 그의 시가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혼탁해진 현대사회에 한 줄기 섬광의 빛이 될 수 있는 소이(所以)인 것이다.

▶정약수 교수는
1979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2010년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2006년 계간 <수필춘추>로 수필가로 등단했다. 새한영어영문학회장, 수필부산문학회장, 부산문인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대 평생교육원 효원수필아카데미 주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