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제도, 자기희생으로 완성하다
자기 살베어 비둘기 구한 시비왕
〈현우경〉 등 여러 경전에 수록돼
2세기부터 부조·도상으로 제작
이차돈 순교 표현서도 확인 가능
고려시대 이전 이야기 전래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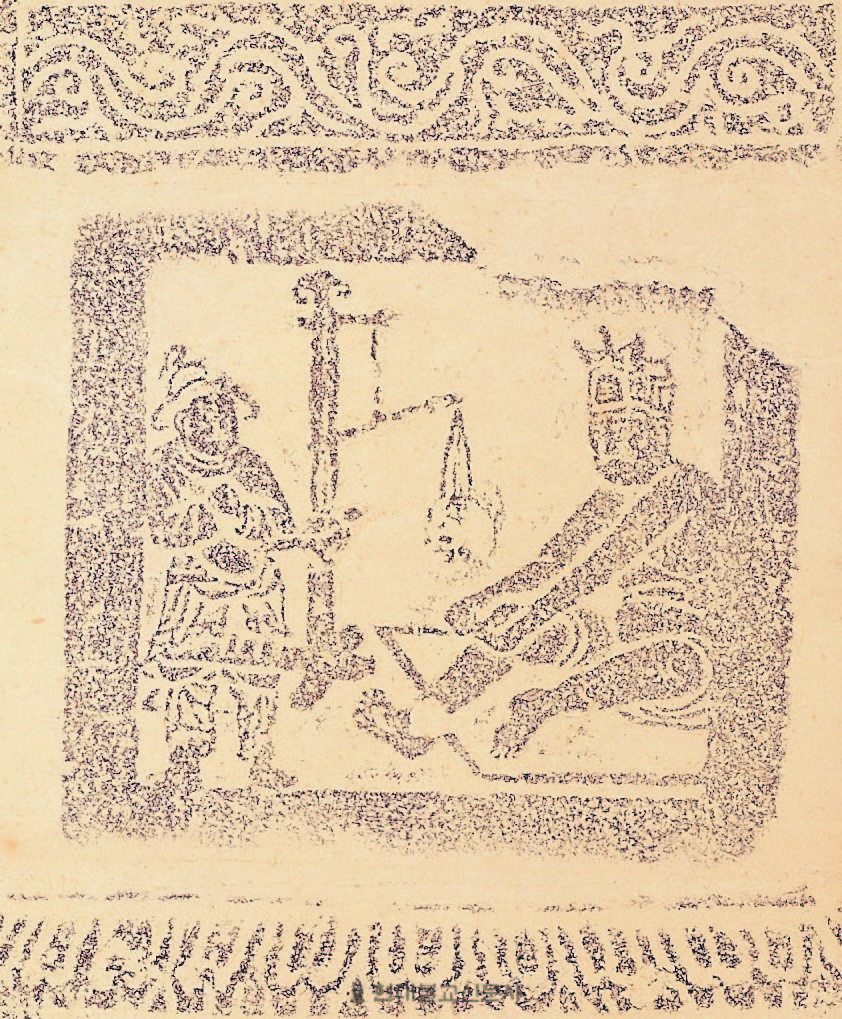
노예제도와 순장제도가 있었던 2300년 전 맹자는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평등과 인권을 외치는 지금의 세상은 오히려 사람의 가치를 생명의 존귀함보다는 수입·학력·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가격을 매기어 판단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육신을 값으로 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단순히 저울에 무게로 달아서 값을 매길 수 있을까? 종종 우리는 아끼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들어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실천을 행한 이를 보기 어렵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 중에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시하신 ‘시비왕 본생담’(尸毘王, ivi, 聖王) 이야기를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이타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현우경(賢愚經)〉 제1권, 〈불설보살본행경(佛說菩薩本行經)〉, 〈육도집경(六度集經)〉, 〈대지도론(大智度論)〉, 〈보살본생만론(菩薩本生?論)〉 제1권, 〈대장엄론경(大莊嚴論經)〉 제12권 등 많은 경전에 실려있다. ‘시비왕 본생담’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는 오랜 옛날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왕으로서 이름은 시비였으며, 항상 자비를 행하여 일체중생을 가엾이 여겼다. 그때 죽음의 징조가 나타난 제석천이 비수갈마와 함께 시비왕이 진정으로 보살행을 실천한다면, 마땅히 죽기 전에 의지할만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시비왕을 시험하게 된다. 이들은 비둘기로 변한 비수갈마가 매로 변한 제석천에게 쫓겨 시비왕에게 날아가서 보호를 청했을 때, 왕의 본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곧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의 뒤를 쫓아 잡아먹으려 하였다. 그때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하며 왕의 겨드랑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하였다. 이를 본 매가 왕에게 그것은 내 밥이니 굶주린 내게 빨리 돌려달라고 말하자, 시비왕이 본래 나의 서원은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 내게 와서 의지한 비둘기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매가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면서 굶주려 죽을 내 목숨은 구제하지 않을 거냐는 물음에, 왕이 다른 고기를 주겠다고 하였다.
매가 갓 죽인 더운 고기만 먹는다고 답하자, 왕은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매에게 주고 비둘기의 목숨과 바꾸고자 하였다.
그때 매가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면 저울질을 하여 편편해지도록 해야 공평하다고 말하였다. 왕은 곧 저울추를 가운데 달고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한쪽에 얹고, 자신의 다리에서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 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워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었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 보다 모자랐다. 왕이 스스로 저울판에 올라가자 천지가 진동하며, 왕이 어려운 법을 실천한 모습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때 제석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보살행을 실천하는지 묻자 왕은 불도를 얻기 위함이며, 고통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서원하였다. 곧 왕의 몸은 곧 회복돼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시비왕 본생담’은 기원후 2~3세기 간다라 지역에서 부조로 표현되기 시작해 3~4세기 쿠차(庫車, Kucha) 지역의 키질 석굴, 돈황(敦煌)지역 석굴사원의 경우 4세기부터 만당(晩唐) 시기인 9세기까지 꾸준히 석굴의 벽면에 도해됐다. 그리고 8~9세기에 조성된 인도네시아 자바 보로부두르 대탑에서도 이를 묘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현존 가장 이른 간다라의 〈시비왕 본생부조〉를 살펴보면, 화면의 왼쪽에 의자에 앉은 시비왕과 왕의 종아리 살을 칼을 든 인물이 베어내고 있으며, 왕의 아래 매로부터 몸을 숨긴 비둘기가 묘사돼 있다. 그리고 화면의 상부에 비둘기를 쫓는 매가 보이며, 가운데에는 저울을 든 인물과 저울에 올라간 비둘기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금강저를 든 인물은 매로 변신했던 제석천이다. 표현된 인물들의 표정에서 긴장감과 생살을 베어내는 고통이 생생하게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끈으로 저울의 수평을 잡아 무게를 재는 이동식 저울의 모습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돼 있어 눈길을 끈다.
다음으로 돈황 막고굴(莫高窟) 254굴은 북위 시대(北魏, 386~534)에 조성된 석굴로서, 주실의 북벽에 〈시비왕 본생도〉가 자세하게 서술적으로 표현됐다. 화면 중앙에 반가좌한 시비왕의 머리 위에 하얀색 매가 초록색 비둘기를 쫓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어 시비왕의 오른손 손바닥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으며, 왼쪽 다리 앞에 칼로 왕의 다리에서 살을 베어내고 있는 인물과 하얀 매가 보인다. 그리고 시비왕의 왼쪽에는 세 명의 궁인이 눈 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왕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슬픔에 오열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칼을 든 인물의 옆에 하얀색 삼각형의 모자와 소그드 상인의 복식을 착용한 인물이 앞서 간다라의 부조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이동식 저울을 왼손에 들고 있다. 저울을 든 인물의 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저울의 기울기가 저울에 올라앉아 합장을 취하고 있는 시비왕쪽이 아니라 반대편 저울에 올라간 비둘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당 시기(848~907) 9세기경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 85굴 〈시비왕 본생도〉는 화면의 오른쪽에 합장을 취한 채 중국식 긴 의자에 앉아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비왕과 칼은 든 인물 그리고 왕의 뒤로 두 명의 후궁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커다란 고정형 저울이 묘사되어 있으며, 저울의 위에 앉아 시비왕의 다리 살을 지켜보는 흰색 매와 좌우 저울의 접시 위에 파란색 비둘기와 시비왕의 다리에서 떼어 낸 붉은색 살덩어리가 놓여있다. 간다라 부조와 막고굴 254굴에서 느껴졌던 고통과 긴장감은 많이 사라졌고, 대신에 중국적인 복식과 사물들이 눈에 뛴다.
그런데 간다라,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위의 ‘시비왕 본생담’의 내용이 기록된 글과 유물이 현존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흥법(興法)’의 ‘원종흥법 염촉멸신조’(原宗興法 厭觸滅身條)에 시비왕의 보살행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염촉(이차돈)이 자신을 희생하여 중생들이 불법의 이익됨을 깨닫게 하려 하였다. 이때 왕(법흥왕)이 말하길 살을 베어 저울에 달더라도 한 마리 새를 살리려고 했고, 스스로 피를 뿌리고 목숨을 끊어서라도 일곱 마리의 짐승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삼국유사〉가 기록되기 이전 혹은 이차돈의 순교 이전에 이미 시비왕의 이야기가 한반도에 전래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보협인탑(寶튒印塔)의 사면에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인 ‘시비왕 본생’, ‘살타태자투애사호 본생’(薩댧太子投崖飼虎), ‘월광왕손사보수 본생’(月光王損捨寶首), ‘수대나태자 본생’(須大拏太子本生) 네 종류가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 탑의 조각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탁본한 그림을 살펴보면, 화면의 오른쪽에 높은 관을 쓴 시비왕이 양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쪽 다리 살을 잘라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왼쪽에는 전립(戰笠)을 쓴 인물과 저울에 올라간 비둘기가 묘사되어 있다.
시비왕의 보시와 일체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의 가치를 잴 수 있는 저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비왕처럼 나를 송두리째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한다면 보살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