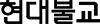어느덧 올해도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없이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 같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다시 2.5단계로 위험수위가 격상되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이별의 고통은 이산가족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일산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있다가 지금 현재 다른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 임종의 여정에 다다른 동생 때문에 가슴 졸이는 한 거사가 법당을 찾았다. 그 곳 병원은 일산병원보다 출입의 제한이 훨씬 엄격하여 가족들이 전혀 병문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어머님이 동생을 간병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 전화로 동생의 상태와 어머니의 안부를 듣고 있다고 하였다.
“거사님, 그래 얼마나 힘드세요”하고 위로말씀을 드리자 거사는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급기야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군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답답하지만, 연로하신 어머니는 오도가도 못하고 병원에 붙잡혀 계시니 죽어가는 아들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가 미칠 것만 같습니다.”
거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울부짖음으로 변하고 있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할지 나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를 나오시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거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시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사의 마음이 오죽 답답할까 싶었다.
일산병원에서 잠시 뵈었던 노보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엔 불자라는 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가 다가가자 수줍게 불자임을 밝혔던 분이셨다. 아들이 암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하였다. 아들의 병이 자신의 업이고 죄인 것만 같다고 하였다. 친척에게도 동네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고만 싶다고 말하는 보살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시간도 없이 환자는 다음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동생이 가고 나면 스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사는 수그리고 있던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저도 마지막 배웅의 길에는 꼭 함께하며 동생분도 어머님도 위로해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는 거사의 뒷모습에 올해 12월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앙상한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모양이 마지막 잎새와 같이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