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각랑 도성(覺浪 道盛)
송대 이후의 ‘삼교일치’ 새경향
각랑, 유불일치 사상적 집대성
선종으로 불교 각 종파 통섭해
송대 이후 중국 선종의 흐름은 선교일치 선정일치 특히 삼교일치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선종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는 시대가 지니고 있었던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수ㆍ당의 찬란했던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중국인들은 새로운 관점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세우고자 했다. 특히 송대로 접어들면서 신유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고, 이때 불교계도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곧 삼교일치라는 새로운 사상적 융합을 주장했다. 이후 송·명·원·청대를 거치면서 불교역사에서 이름을 떨친 대부분의 고승들은 모두 삼교일치를 주장했다. 명말의 고승인 각랑 도성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불일치의 사상적 집대성을 이룩한 선사이다. 또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동원하는 등 동서분주하면서 쇠락해가는 명나라를 지켜내는 데 평생을 바쳤던 인물이기도 하다.
각랑 도성(覺浪 道盛ㆍ1592~1659)은 명나라 말엽 조동종의 선승이며, 조동종의 사상으로 선종을 집대성한 인물로서 별호는 장인(杖人)이다. 속성은 장(張)씨이고 복건성의 포성(浦城)인이다. 19세에 출가했으며, 명대 만력 44년(1616) 강서동암(江西董岩)에 주하는 무명 혜경(無明 慧經ㆍ1548~1618, 명나라 말엽 조동종의 승려)선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가 구족계를 받았다. 오래지 않아서 그는 또 무명 혜경(無明 慧經)의 제자인 원경(元鏡)문하에서 선법을 배웠다. 득법 후 강남 각지를 유역하면서 40여 년 동안 선법을 전법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즉 불교경전 어록 및 유학 노장학 등 내외에 관한 백여 종의 책을 편찬했다. 이외도 그의 제자 대성(大成), 대기(大奇)가 집성한 <천계각랑성선사어록(天界覺浪盛禪師語錄)>12권, 대성, 대준(大峻)이 편찬한 <천계각랑성선사전집(天界覺浪盛禪師全集)> 33권, 진단충(陳丹衷), 모찬(毛燦) 등이 편집한 <장인수집(杖人隨集)> 2권, <천계각랑성선사가화어록(天界覺浪盛禪師嘉禾語錄)> 1권 등이 있다. 또 법제자가 27인이나 된다고 하며, 특히 명말 난세를 피해서 그에게 계를 받은 명사제자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는 명나라 유민이었는데, 조동종의 선사로서 유가의 색채를 농후하게 지닌 인물이다. 그는 유가로써 종(宗)을 삼아서 도교와 불교의 회통을 주장하면서, 삼교회통을 실현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또 그는 명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애국정신이 충만했고, 명말 청초 선종의 쇠락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명나라 유민으로 항청(抗淸)의 기치를 들었던 선사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행동은 그가 집대성한 저술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그의 다작 가운데 하나인 시작(詩作)에 보면 이윤(伊尹), 관중(管仲), 장량(張良), 제갈량(諸葛亮) 등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역사에서 군주가 무능력했거나, 혹은 망하고 쇄락해가는 나라를 도와서 일으킨 현신(賢臣)들로 묘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도 아마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러한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명ㆍ청(明ㆍ淸)사이에 많은 사대부들이 그를 따라서 출가를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대부들이 앞을 다투어 그의 저작에 서를 쓰기도 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명나라 때 관료 및 청나라 신 관료 및 귀족들도 포함되어있다.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많은 반청(反淸)인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은 의사이고, 반은 승이 되었다(半爲義士半爲僧)”고 했는데, 사실은 의사(義士)와 승(僧)은 왕왕 합해서 일체(一體)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풍토에서 승려가 된 유명한 인물로는 진사인 예가경(倪嘉慶), 방이지(方以智), 전징지(錢澄之), 영남삼대가(嶺南三大家)의 한 사람이자 시인인 굴대균(屈大均)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각랑 도성의 제자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그가 당시 많은 유가의 사대부들에게 많은 존경과 추앙을 받은 방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진도고승(眞道高僧)’과 ‘충신열사(忠臣烈士)’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그는 멸망해가는 명나라의 관(官) 군(軍) 민(民) 선(禪) 등을 일체로 보고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당시 명대의 많은 유명한 유학자 및 관료들이 명대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승려가 되기도 했다.
유불합일 사상은 각랑 도성의 중심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진정한 유학은 불교를 피할 필요가 없고, 진정한 불교는 유교가 아닌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 특히 사대부들이 탄복해서 명망 있고 권세 있는 왕공대신들이 문을 두드려서 입실하였고,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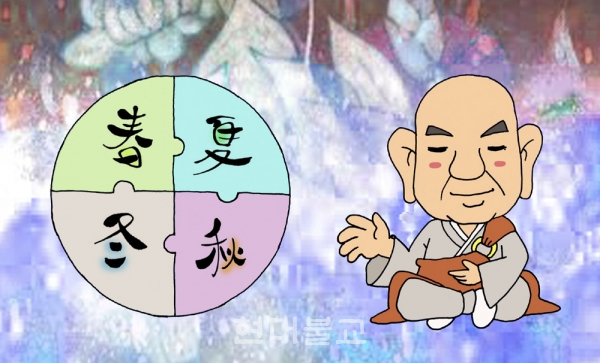
각랑 도성은 불교를 집대성하였는데, 즉 불교의 각종 종파를 모아서 전서(全書)를 이루었으며, 곧 선종으로써 각 종파를 통섭했다. 그는 말하기를 “불보살 및 모든 조사들이 출세(出世)하신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시종 본말이 모두 깊고 심오한 것으로 가지가지의 경ㆍ률ㆍ논장ㆍ정토ㆍ지관ㆍ참회 등의 법으로 종파(宗派)를 시설한 것도, 또한 깊고 심오한 시종의 본말을 끊어 선종으로 섭해서 불조를 모아 대성(大成)을 이루었다. 이미 더 이상 나타낼 것이 없다”고 했다. 즉 한 몸에 모든 것을 포함했다는 의미로서, 일체 불교의 실천수행 및 이론들을 모아서 하나의 선종에 모두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저 5경이 비록 하나의 전집이 되었지만, 시ㆍ서ㆍ예악ㆍ춘추도 또한 각각 본경에 전집이 있는 것을 방애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함께 종문(宗門)의 조사를 모아서 달리 하나의 통(統)을 지어서 대전(大全)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곧 경(經)ㆍ율(律)ㆍ론(論)ㆍ관(觀)도 또한 각각 통(統)이 있어서 하나의 전집을 만들었다. 저 선(禪)에는 스스로 오종(五宗)이 있어서 통경(統經)을 삼았고, 스스로 오교(五싱)가 있어서 통율(統律)을 삼고, 스스로 오부(五部)가 있어서 통론(統論)을 삼았고, 스스로 오섭(五攝)이 있어서 통(統)을 삼았다. 그러나 나의 경(經)ㆍ율(律)ㆍ논(論)ㆍ선(禪)ㆍ정(淨) 등은 불자(佛者)의 대통(大統)이고, 바로 저 시(詩)ㆍ서(書)ㆍ예(禮)ㆍ이(易)ㆍ춘추(春秋)는 유교의 대통(大統)이다. 경ㆍ율ㆍ논ㆍ선ㆍ정 등은 각각 통기(統紀)가 없다. … 곧 제당(諸堂)에서 성인을 선택하고, … 고로 내가 조도(祖圖)를 모아서 만들었으니, 곧 경ㆍ율ㆍ논ㆍ정ㆍ지관ㆍ참회법 등을 알아서, 다 마땅히 각각 그 종(宗)을 모아서 대전(大全)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즉 그는 여기서 경ㆍ율ㆍ논ㆍ정(淨)ㆍ선 등에 또한 각자 통(統)이 있다고 여겼다. 다만 그것들은 소통(小統)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소통(小統)은 반드시 대통(大統)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고, 선성장(選聖場ㆍ성인을 선택하는 장소)의 총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大統)은 반드시 소통(小統)을 바탕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서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여겼다. 때문에 반드시 ‘대통’은 ‘소통’이 승인하는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대통과 소통의 관계를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선종의 지위를 우위에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회통의 최후를 모두 조동종으로 회귀시켰는데, 곧 조동종으로 선종 오종의 종지를 삼았다.
그는 또 경ㆍ율ㆍ논ㆍ관ㆍ선을 일세통사시(一歲統四時)의 비유로 오가(五家)를 비교해서 오종(五宗)간의 통섭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즉 경은 곧 발연(勃然ㆍ무성 왕성한 것) 개발하는 것이 봄과 같고 율은 곧 찬연부진(燦然敷陳ㆍ찬란하고 풍성하게 펼쳐진 것)한 여름과 같고, 논은 곧 늠연정핵(凜然精?ㆍ매우 위엄이 있고 엄하고 정교하다)한 가을과 같고, 관(觀)은 곧 명연청철(冥然헌徹ㆍ고요하고 맑고 깨끗하다)과 같은 겨울과 같고, 선은 곧 혼연통흡(渾然通洽ㆍ 혼연해서 잘 통한다)해서 마치 세월을 말없이 운용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비교로써 선과 기타 ‘소통’과 차별을 두었으며, 동시에 선을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지고무상(至高無上)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는 선종의 오대 종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였는데, 곧 “오직 선종으로 비교하자면, 위앙종은 곧 봄의 생장(生長.生育)과 같고, 임제종은 곧 여름의 발로(發露ㆍ분명하게 드러내다)와 같고, 운문종은 곧 가을의 엄격함과 같고, 법안종은 곧 겨울의 맑고 깨끗한 것과 같고, 조동종은 곧 사계절을 통화(統化)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대충 비교한 것으로 이와 같이 섭수하고 절복(折服)했을 뿐이다. 어찌 위앙 임제 조동 운문 법안의 종지에 우열과 같고 다름이 있겠는가?”라고 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가 집대성한 사상은 곧 선종을 통해서 불교 전체를 회귀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특히 선종의 가운데서도 조동종으로 선종 오가를 통섭하고, 최후에는 조동종으로 일체불교를 통섭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사실 그의 집대성의 목적은 우선 선종을 우위에 두고, 마지막에는 조동종을 가장 우위에 두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명말 청초의 불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당시 종파간의 반목 모순 투쟁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의 중국선종은 오가 중에서 3가가 이미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지가 오래 되었고, 오로지 임제종과 조동종만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조금 더 역사를 소급해 보면, 마조 도일의 계통인 홍주종에서 임제종이 발생을 하였고, 석두 희천의 계통인 석두종에서 조동종이 발생되면서, 이 두 종파는 장기간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면서 화합을 하지 못했다. 이미 명말 청초에 이르러서는 양가의 투쟁은 매우 격렬하였다고 전해진다.
청초에 임제종의 승려인 감박 성총(벱璞 性聰), 옥림 통수(玉林 通琇), 공계 행삼(察溪 行森), 목진 도민(木陳 道뤿) 등은 순치황제의 부름을 받고, 참선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정도로 자주 황궁을 출입했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결과로 황제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면서 임제종의 지위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조동종은 자연히 임제종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임제종이 정치세력의 외호를 받으면서 조동종은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예로서 선권사(善權寺)를 놓고 장기간 투쟁 중에 보인 임제종 승려들의 태도를 보면 더욱더 선명해진다. 완전히 불교에서 주장하는 육화(六和)정신을 위배하는 행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조동종은 정치상에서 외호를 받지 못했지만, 다만 반대로 사상적으로 반격을 할 수는 있었다. 때문에 각랑 도성은 조동종으로 전체 선종을 통섭해서 일체 불교를 집대성한 것도, 이러한 당시의 환경을 극복 내지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로, 혹은 임제종을 반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