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불성론과 여래장 및 법신설 관계
‘불성론’을 부정하는 경전도 보여
유가행파 ‘오종성’으로 불성 분류
위진은 반야론·남북조는 불성론
불성과 여래장 의미는 대동소이
중기대승불교가 흥기한 후에 불성론은 크게 발전했다. 이 시기에 출현한 대승경전은 여래장사상을 결합해서 불성론 사상을 더욱더 심화해서 발전해갔다. ‘여래장’에 대한 해석은 매우 많다. 기본적인 의미로서 여래장은 일체중생이 모두 본래 청정한 여래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성론이 청정한 본성[自性]을 성불의 목적으로 보았다면 여래장사상은 불성론과 결합한 청정법신을 성불의 근원으로 삼았다.
〈승만보굴(勝?寶窟)〉에 보면 일체중생의 불성을 3종류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자성주불성(自性住佛性)으로, 중생이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불성이다.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自性)이 상주한다고 한다. 두 번째는 인출불성(引出佛性)으로, 수행을 통한 선정지혜의 계발로 얻어지는 불성이다. 세 번째는 지득불성(至得佛性)으로, 수행을 통해서 원만한 과를 증득해서 나타나는 불성이다.” 이외도 〈법화경〉 〈화엄경〉 등에서도 불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화경〉 관점에서 불성은 불지견이다. 즉 ‘상불경보살’이 항상 일체중생에게 예배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이다. 이 점이 바로 불성이 있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또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 불타의 수명에 관해서 말하기를 “여래 수명이 장원(長遠)할 때 육백팔십만억나유타항사성중생이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부처님의 법신불멸 및 본성의 초월성에 대한 설명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불성론 및 여래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승경전은 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선근(善根)’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행을 해도 성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심밀경〉 ‘무자성상품’에서 “유정세계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종성(宗姓) 차별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 사람들의 근기 또한 같지 않으며, 근기 중에는 이근(利根), 둔근(鈍根ㆍ선근이 부족한자)이 존재하기도 한다. 비록 불타께서 여러 가지의 방편을 사용해서 둔근자(鈍根者)를 인도하고 교화하지만, 결국 이 둔근자들은 무상보리 무상정각을 획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하열한 근기의 소유자들은 불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승경전 가운데 〈해심밀경〉 이외도 〈유가사지론〉 등에서 모두 같은 주장을 펼친다.
인도의 유가행파는 불성에 관해서 오종성(五種姓)을 주장했다. 유가행파는 인도에서 4~5세기에 흥기한 대승불교의 교파로서 유가유식학파이다. 즉 대승중관학 다음으로 생겨난 학파이다. 이 학파는 세계의 본원은 심식(心識)이라는 관점이다. 세계의 만물은 모두 심식의 변현(變現ㆍ唯識無境)이라는 것이다. 이파가 불성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일체중생이 선천적으로 본성을 구비하고 있거나 혹은 구비하지 못한 상태를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①성문종성(聲聞種性), ②연각종성(緣覺種性:獨覺宗性), ③보살종성(菩薩種性:如來宗性), ④불정종성(不定種性), ⑤무종성(無種性)이다. 여기서 앞의 3종류인 정성성문(定性聲聞), 정성독각(定性獨覺), 정성보살(定性菩薩)은 통칭 ‘삼승(三乘)’이라고 한다. 이 삼승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아라한과 내지 벽지불 불과(佛果) 등과 상응하는 과위를 증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불정종성(不定種性)은 삼승의 종자를 구비하고 있지만, 최종의 과위를 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완전히 개인의 수행 정도에 의거해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 무종성(無種性)은 또 무성유정(無性有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종류의 중생은 선근 종자가 끊어진 상태로서 영원히 생사고해에 침륜해서 도저히 성불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가행파의 오종성설(五種性說)은 아마도 당시 인도사회가 계급사회로서 이러한 사회적 형태가 직ㆍ간접으로 불교교의에 반영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유가행파의 관점이라면 중생의 종성은 아뢰야식의 종자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천성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과 수행을 하더라도 자기의 운명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물론 반대로 〈열반경〉에서는 일천제(一闡提)조차도 성불할 수 있다고 적고 있기는 하다. 유가행파의 오종성설(五種性說)은 당나라 현장법사가 중국에 번역해서 소개가 되면서 중국 법상종의 기본적인 이론이 되기도 했다. 사실 현장법사가 인도의 구법여행을 떠난 것도 ‘불성은 본유(本有)인가, 시유(始有)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어서 중국에서 불성론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위진 남북조 시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진 시기에 반야론이 유행을 했다면, 남북조 시기에는 불성론이 유행을 했다. 이 형태는 인도에서 반야중관학이 먼저 발전을 하였고, 이어서 유가행파가 발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중관파가 반야공성을 본질로 보았다면 유가유식파의 본질은 아뢰야식이라고 할 수 있다(아뢰야식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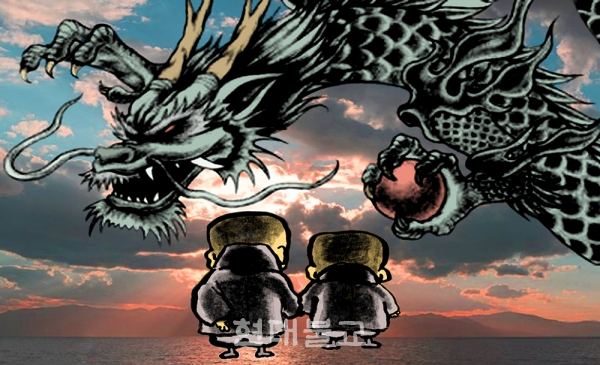
중기대승불교시기에 여래장사상에 관련된 경전이 많이 찬술되었는데, 사실 여래장이라는 단어가 최초를 나타난 곳은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서품이다. 즉 “..,문득 여래장으로 총지를 삼으면, 비록 금생에 몸의 번뇌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후생에는 문득 높은 재능과 지혜를 얻는다”고 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불성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앙굴마라경〉에서는 여래장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 경에서는 불성이라는 단어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뜻은 거의 불성의 의미와 대동소이하다.
여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및 특성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앙굴마라경〉에서 보면,불성과 마찬가지로 “여래장은 있으되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有如來藏而眼不見)”고 했으며, 또 “여래장에 무슨 뜻이 있는가? 만약에 일체 중생에게 모두 여래장이 있다면, (그것은)곧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如來藏者有何義, 若一切콎生悉有如來藏者, 一切콎生皆當作佛)”는 것이며 “여래장의 뜻은 자성청정(自性淸淨)의 뜻이다”고 했다. 이러한 의미들은 모두 “불성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다. 또 “여래장 얻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하면서, “무량한 번뇌에 덮인 바가 되어서 모든 악업을 짓고, 자성심이 여래장인줄 모르고 무량한 번뇌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 “아(我)라는 것은 곧 여래장의 뜻이다.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뜻은 곧 我의 뜻이다. 이와 같이 我의 뜻은 본래부터 이미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고 했다. 여기서도 여래장과 불성이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아(我)가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다”는 의미는 초기부파불교에서 주장했던 심성본정, 객진소염(心性本淨, 客塵所染)과도 맥을 같이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래장의 의미 및 속성은 거의 불성과 대동소이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초기대승불교에서는 여래장과 불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사용하는 각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불성이 비인비과(非因非果)의 각도에서 출발했다면 여래장은 비염비정(非染非淨)의 각도에서 출발한 점이다. 여래장에는 또 ‘여래장은 선불선인(如來之藏是善不善因故)’의 뜻과 ‘공여래장 불공여래장’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처음부터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후대의 대승경전이 편찬되면서 보완과 보충을 한 내용들이다.
이외도 여래장을 집중적으로 다룬 대승경전이 다수가 존재하는데, 〈금강삼매경〉, 〈대보적경〉,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 〈대방등여래장경〉, 〈대방등여래장경〉, 〈대법고경〉, 〈능가경〉, 〈능엄경〉등이 있으며 논장으로는 〈구경일승보성론〉, 〈석마가연론〉, 〈금강삼매경론〉 등이 있고 중국에서 찬술한 주석로서 〈승만보굴〉,〈대승법계무차별론소〉,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대방광불화엄경소〉 〈묘법연화경현의〉, 〈대반열반경의기〉 ,〈능가아발다라보경주해〉, 〈주대승입릉가경〉, 〈대방광원각수다나료의경약소〉, 〈수릉엄의소주경〉, 〈대승법계무차별론소〉, 〈대승기신론별기〉, 〈기신론소필삭기〉 원효소인 〈기신론소〉 등이 여래장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경론과 주석서들이다.
이러한 불성론 및 여래장 사상은 중국선종에 다양한 개념으로 용해되어서 수행의 방편이 되었다. 예를 들면 대혜종고가 간화선에서 무심의 상태를 진여불성자리로 보았다면, 조동종의 청동굉지의 묵조선은 본증묘각을 현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불성(여래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선종에서 자주 사용한 용어 가운데 심지심성(心地心性) 등과 같은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