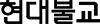부도밭 기행 70(끝)- 법음과 차향 어우러진 쌍계사

‘진감선사대공영탑’ 최치원 사산비 중 하나
범패와 차 재배의 발원지 ‘우뚝한 역사’
하동 쌍계사라는 절 이름을 들으면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있습니다. 먼저 파릇한 녹차의 새순과 그윽한 차향기가 떠오릅니다. 쌍계사 일원은 우리나라에 녹차가 처음으로 재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영남의 노래 ‘화개장터’와 더불어 십리 벚꽃길이 떠오릅니다. 더하여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깊은 물길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봄기운을 느끼기에는 이르지만, 지리산을 돌아 화개장터가 가까워질수록 거기에는 이미 봄이 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벚꽃들이 어린 눈을 뜨고 따사로운 봄바람에 하염없이 흔들리고 차 밭에서는 새싹들이 그야말로 참새 혓바닥만치 돋아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감도 없이 하품처럼 늘어뜨린 기대는 썰렁한 화개장터와 물이 마른 계곡을 지나는 동안 차가운 바람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과 겨울입니다. 먼 곳에서 미리 전령을 보냈을 테지만 그마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들뜬 마음으로 쌍계사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웃 산의 절도 옥천(玉泉)이라 일컬었으므로 이름이 겹쳐져서 백성들의 귀를 미혹하게 할 까 염려하였다. 같은 이름을 버리고 달리하려 한 즉, 마땅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좇아야 하는데 그 절이 자리한 곳을 살펴보게 하니 동구(洞口)에 두 시냇물이 마주 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제액(題額)을 내려 쌍계사라고 하였다.
쌍계사 대웅전 아래 홀로 서 있는 ‘진감선사대공영탑비문(眞鑒禪師大空靈塔碑文)’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깊은 학문과 걸출한 문장으로 따를 자가 없는 고운 최치원이 찬했습니다. 쌍계사가 ‘옥천사’라는 이름으로 창건 된 것은 진감선사(774~850) 이전의 일이지만, 중국으로 건너가 조계선풍의 적손이 되어 귀국한 진감선사에 이르러 쌍계사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정강왕이 절 이름을 직접 지어 준 것은 진감선사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였고 이후 대통을 이은 왕들도 쌍계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진감선사의 덕화가 신라의 하늘을 덮을 만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옆면이 보이는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를 먼저 살펴봅니다. 세월의 무게와 전란의 광기를 이기지 못해 금이 가고 탄환 자국이 선명한 몸돌이 철제 보호 장치에 의존해 서 있습니다. 887년에 세웠으니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125년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귀부도 몸돌도 이수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 거친 시간 을 버텨 온 것만으로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탑비의 존재감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가 담고 있는 문장은 최치원의 사산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문이 진감 선사와 그의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신라 말의 여러 정황들을 전하는 확실한 기사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쌍계사 홈페이지에서는 이 탑의 제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의 높이는 3m 63cm, 탑신의 높이는 2m 2cm, 폭은 1m, 귀부와 이수는 화강암이고 비신은 흑대리석이다. 현재 비신의 우측 상부에 크게 흠락된 부분이 있고 또 균열이 상당히 심하다 .중앙에 높직한 비좌를 마련했는데 4면에는 운문이 있고 상면에는 비신에 맞게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귀두는 짧고 추상적인 동물의 머리로 표현되어 신라 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수는 양측을 비스듬히 자른 오각형으로 4면에 쟁주 하는 용이 있고 전면 중앙에 방형으로 깊이 판 제액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문의 자경은 2.3cm, 자수는 2423자이다.”
몸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자들이 참으로 정갈합니다.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천년이 넘는 세월의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진감선사는 문성왕 12년(850)에 입적했습니다. 문인들을 불러 놓고 “나는 이제 가려한다. 너희들은 일심으로 근본을 삼아 힘써 노력하라. 탑을 만들어 형상을 보존하지 말고 명(銘)으로써 행적을 기록하지도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난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을 흠모하는 마음을 어찌 표현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스승의 지엄한 당부를 아침나절의 이슬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진감선사가 입적하고 36년 후에 헌강대왕이 ‘진감’이라는 시호와 ‘대공영탑’이라는 탑호를 내려 부도를 모시고 탑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찬하며 이러한 사정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고승의 비문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의 증명입니다.
종루를 지나 금당(金堂)을 향해 계단을 오릅니다. 그러나 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육조정상탑을 참배하고 싶었지만,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호두봉 꼭대기에 있는 진감선사부도(보물 제380호)를 향합니다.
국사암 200m 전방에서 갈림길이 나오고 불일폭포 가는 길로 접어들어 산모퉁이 두엇을 지나 좁은 길을 버리고 길인 듯 아닌 듯한 비탈을 오릅니다. 100m 쯤 올라간 곳에 부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범패를 처음으로 들여와 불교음악의 창시자가 된 진감선사의 부도. 바람이 불면 느리게 춤사위를 연출하는 노송 두 그루가 호위하듯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을 찌를 듯 훤칠한 키의 적송 두 그루가 가지를 안으로 숙여 부도를 덮고 있는 기이한 모습에 놀랍니다. 비나 눈이 와도 부도는 이 소나무로 인해 몸이 젖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도는 단아합니다. 기단에서 상대석에 이르기까지 연꽃무늬가 적절히 배치되어 숭고함을 더했고 비례를 잃지 않은 탑신과 옥개석의 조화가 선사의 풍모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봉우리에 말없이 서서 저 아래 절에서 울리는 목탁소리 염불 소리를 다 들으며 천년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말이 필요 없어서,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감선사는 중국 땅에서 구법여행을 다니다가 도의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귀국한 도의 선사는 이 땅에 선문을 열어 말없이 전해 온 부처님의 보배를 별처럼 박아 두었습니다. 진감선사 역시 범패를 들여왔고 선지를 드높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법향을 축내지 않고 있습니다.

진감선사의 부도 앞에 서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2009년 1월 1일 도의선사의 은거도량인 진전사를 찾아갈 때의 마음과 3년이 지나 진감선사의 도량에서 찬바람을 안고 서 있는 이 마음은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무엇이 같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진전사에서 쌍계사까지. 70여 사찰의 부도밭을 쏘다니며 수많은 선지식들을 만났고 그 유훈의 지고한 기상에 홀로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부도밭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성성하게 살아 있는 또 다른 설법전임을 외쳤습니다. 부도밭을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흩어진 부도와 탑비를 정비하는 몇몇 사찰을 보며 솟구치는 존경심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부도밭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역대 조사의 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을 외면하면 한국불교의 내일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부도를 ‘승탑(僧塔)’이라고 공식화 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법신의 상징물)를 모신 탑은 불탑이고, 스님의 사리를 모신 탑은 승탑이다’ 이런 논리인가 봅니다. 거기에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선불교에서 조사는 부처님입니다. 조사들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부처와 조사라는 관념 속의 허상마저 처단하여 스스로 부처의 당체를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활달한 기상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의 삶을 살다 간 조사들을 굳이 ‘스님’이라는 이름에 예속시켜 승탑이라는 이름을 고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자가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는 불탑과 승탑을 구분 짓는 그 자체가 탑 위에 탑을 쌓는 일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을 마무리 하는 지리에서 넉두리 해 보는 겁니다.
여기가 종착점은 아닐 것입니다. 꼭 갔어야 할 곳을 못가기도 했을 것이고 갔으되 눈이 어두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곳도 많을 것입니다. 틈틈이 더 발품을 팔아 이 기행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이 연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독자제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