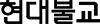2005년 7월 21일. 한의원 개원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작지 않은 일이었다. 10년 간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돌봐왔는지,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수행은 또 어땠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부산 새말귀선원에서 열흘 뒤 열리는 3박4일 용맹정진에 참가할 계획도 세웠다.
그날 오전 10시경 나는 탕전실에 가서 가스 불 위에서 끓고 있는 한약 옹기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한약을 달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황토 옹기에 약을 삼베에 넣지 않고 그대로 달이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황토 옹기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서 달이고 있었다.
그런데 옹기 하나가 가스레인지의 삼발이 위에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놓여 있어 옹기를 살짝 들어서 정확한 위치로 옮겨 놓으려고 힘을 주는 찰나, “퍽!” 하고 옹기가 깨지면서 끓고 있던 한약 액이 무릎 위쪽에서 발까지 흘러내리고 옹기 조각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악!” 저절로 비명이 나왔다. 한의원에서는 항상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한복 바지를 벗고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고 “김 선생!” 하고 다급하게 직원을 불렀다. 양동이를 가져오게 하고 호스를 수도에 연결시켜서 물을 화상부위에 뿌렸다. 그래도 열기가 내리지 않아 양동이에 물을 받은 다음 다리 전체를 담가보았다. 그리고 침을 가져오게 해서 가장 붉은 부위에 침을 놓기도 하였다. 다급한 순간이었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침착했다. 오히려 한의원 직원이 긴장을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화상 부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 화끈거리면서 더 심하게 번져 올라왔다. 그래서 “김 선생, 119 불러라! 안되겠다. 응급실로 가야 되겠다” 하고는 119 구급차가 오면 가기 쉽게 대기실 소파로 가서 앉아 있기로 했다. 다행히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발바닥은 끓는 한약 액이 스며들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서 대기실로 가서는 다시 침을 화상부위의 가장 심한 곳에 자침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매스컴과 논문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화상에 침을 놓으면 흉터 없이 잘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화상치료를 해본 적은 없었다.
119 구급차가 와서 119대원들이 가져온 소독 액으로 소독도 하고 화상거즈를 바르는 등 응급처치를 받고서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다. 가는 도중에 통증이 시작됐다.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아!” 하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침대에 누워서 거즈로 생리식염수를 묻혀서 열기를 식히고 수액주사를 맞았다. 그 사이에 몸이 덜덜 떨리고 한기가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하반신 ‘무릎 약간 위부터 발까지 전신의 10%, 2도 화상’ 이라고 진단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약 기운이 들어가서인지 조금 있다가 오한은 진정되기 시작하였고 화상부위의 화끈거리는 통증도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화상전문 병원으로 옮길 것인지 그냥 처음 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치료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화상부위가 너무 넓어서 일단은 하루 입원해보기로 하였다.
입원을 결정하고 그날 하루는 약에 의존해서 편안하게 쉬었다. 병상에 누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화두참구를 하거나 수식관을 하였다. 숨을 코로 들이마신 다음 화상부위로 호흡을 내쉰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호흡을 하였다. 그 순간 화상을 입었을 당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동안의 수행에서 나왔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환희심이 느껴졌다.
한의원 개원 2년 전부터 새말귀선원을 다녔으니 벌써 선원에 다닌 지도 12년이나 됐다. 그 동안 금요설법, 토요철야정진, 매년 여름겨울 3박4일 철야용맹정진 등을 통해서 수행이랍시고 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따로 호흡 수련을 한 것은 아니지만 화두참구를 하면서 호흡은 저절로 따라왔던 것 같다.
수행의 최종목적이 생사문제의 해결이라고 하신 새말귀선원 선원장 춘당 이황우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다. 화상 같은 것을 당해서는 그럭저럭 판단을 해서 해결을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생사가 걸린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담담하게 대처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기분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다.
어쨌든 오랜만에 쉬면서 마냥 누워 환자노릇하자니 휴식을 취하는 듯 호텔에 와 있는 듯하였다. 앞으로 스스로 고통과 직면해야 하는 폭풍전야(暴風前夜) 같은 날이었다고나 할까? 연락이 닿았는지 선생님께서도 와주셨고 도반들과 동료 한의사들도 문병을 와 주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주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열흘밖에 남지 않은 용맹정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사실 용맹정진(勇猛精進)은 나에게는 ‘마약’과도 같은 행사였다.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리의 기복이 들쭉날쭉 했었는데, 금요설법과 토요철야정진을 하고 나니 월요일까지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마음이 다시 산란해지고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파묻히기 시작해 수요일까지 이틀간은 정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다가 목요일쯤 되면 ‘내일 금요설법 가야지’ 하는 생각에 조금씩 평정을 되찾고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설법을 듣고 철야정진을 하고 나서는 월요일까지 다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흐름이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화요일과 수요일의 산란한 마음은 일주일의 기복이 잦아들어 거의 없다시피 되었었다.
그날 오전 10시경 나는 탕전실에 가서 가스 불 위에서 끓고 있는 한약 옹기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한약을 달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황토 옹기에 약을 삼베에 넣지 않고 그대로 달이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황토 옹기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서 달이고 있었다.
그런데 옹기 하나가 가스레인지의 삼발이 위에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놓여 있어 옹기를 살짝 들어서 정확한 위치로 옮겨 놓으려고 힘을 주는 찰나, “퍽!” 하고 옹기가 깨지면서 끓고 있던 한약 액이 무릎 위쪽에서 발까지 흘러내리고 옹기 조각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악!” 저절로 비명이 나왔다. 한의원에서는 항상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한복 바지를 벗고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고 “김 선생!” 하고 다급하게 직원을 불렀다. 양동이를 가져오게 하고 호스를 수도에 연결시켜서 물을 화상부위에 뿌렸다. 그래도 열기가 내리지 않아 양동이에 물을 받은 다음 다리 전체를 담가보았다. 그리고 침을 가져오게 해서 가장 붉은 부위에 침을 놓기도 하였다. 다급한 순간이었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침착했다. 오히려 한의원 직원이 긴장을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화상 부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 화끈거리면서 더 심하게 번져 올라왔다. 그래서 “김 선생, 119 불러라! 안되겠다. 응급실로 가야 되겠다” 하고는 119 구급차가 오면 가기 쉽게 대기실 소파로 가서 앉아 있기로 했다. 다행히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발바닥은 끓는 한약 액이 스며들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서 대기실로 가서는 다시 침을 화상부위의 가장 심한 곳에 자침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매스컴과 논문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화상에 침을 놓으면 흉터 없이 잘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화상치료를 해본 적은 없었다.
119 구급차가 와서 119대원들이 가져온 소독 액으로 소독도 하고 화상거즈를 바르는 등 응급처치를 받고서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다. 가는 도중에 통증이 시작됐다.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아!” 하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침대에 누워서 거즈로 생리식염수를 묻혀서 열기를 식히고 수액주사를 맞았다. 그 사이에 몸이 덜덜 떨리고 한기가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하반신 ‘무릎 약간 위부터 발까지 전신의 10%, 2도 화상’ 이라고 진단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약 기운이 들어가서인지 조금 있다가 오한은 진정되기 시작하였고 화상부위의 화끈거리는 통증도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화상전문 병원으로 옮길 것인지 그냥 처음 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치료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화상부위가 너무 넓어서 일단은 하루 입원해보기로 하였다.
입원을 결정하고 그날 하루는 약에 의존해서 편안하게 쉬었다. 병상에 누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화두참구를 하거나 수식관을 하였다. 숨을 코로 들이마신 다음 화상부위로 호흡을 내쉰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호흡을 하였다. 그 순간 화상을 입었을 당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동안의 수행에서 나왔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환희심이 느껴졌다.
한의원 개원 2년 전부터 새말귀선원을 다녔으니 벌써 선원에 다닌 지도 12년이나 됐다. 그 동안 금요설법, 토요철야정진, 매년 여름겨울 3박4일 철야용맹정진 등을 통해서 수행이랍시고 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따로 호흡 수련을 한 것은 아니지만 화두참구를 하면서 호흡은 저절로 따라왔던 것 같다.
수행의 최종목적이 생사문제의 해결이라고 하신 새말귀선원 선원장 춘당 이황우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다. 화상 같은 것을 당해서는 그럭저럭 판단을 해서 해결을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생사가 걸린 그러한 일을 당할 때도 담담하게 대처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기분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다.
어쨌든 오랜만에 쉬면서 마냥 누워 환자노릇하자니 휴식을 취하는 듯 호텔에 와 있는 듯하였다. 앞으로 스스로 고통과 직면해야 하는 폭풍전야(暴風前夜) 같은 날이었다고나 할까? 연락이 닿았는지 선생님께서도 와주셨고 도반들과 동료 한의사들도 문병을 와 주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는데 과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주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열흘밖에 남지 않은 용맹정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사실 용맹정진(勇猛精進)은 나에게는 ‘마약’과도 같은 행사였다.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심리의 기복이 들쭉날쭉 했었는데, 금요설법과 토요철야정진을 하고 나니 월요일까지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마음이 다시 산란해지고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파묻히기 시작해 수요일까지 이틀간은 정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다가 목요일쯤 되면 ‘내일 금요설법 가야지’ 하는 생각에 조금씩 평정을 되찾고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설법을 듣고 철야정진을 하고 나서는 월요일까지 다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흐름이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화요일과 수요일의 산란한 마음은 일주일의 기복이 잦아들어 거의 없다시피 되었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