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한자硏 어휘문화총서
기록 속 식물, 조류 조명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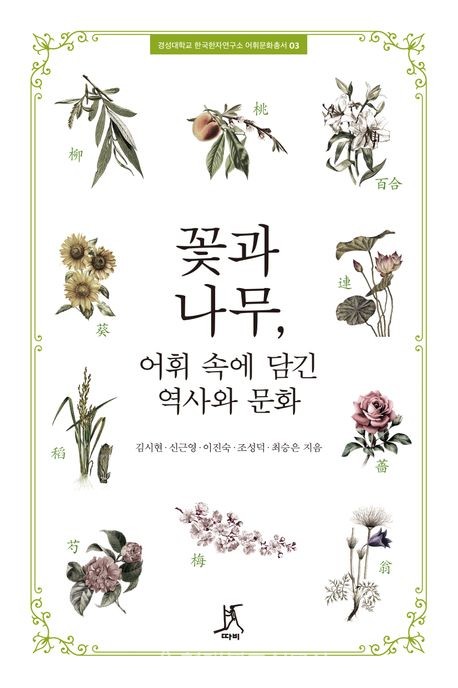
사물의 이름(名)을 지어 붙이는 것은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일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식물, 동물의 이름에서는 그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겼다.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가 펴낸 어휘문화총서 시리즈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문헌 속에서 식물와 동물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활용됐는지를 살펴내고 있다.
최근 발간된 시리즈인 〈꽃과 나무,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와 〈부리와 날개를 가진 동물,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는 각각 식물과 조류에 나타난 어휘들을 살핀다.
불교와 연관된 꽃과 나무는 단연 연꽃이다. 연꽃은 인도가 원산지로 불교와 함께 동쪽으로 전파됐다.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깨끗한 꽃을 피운다고 해서 청정함과 서방극락정토를 상징한다.
연꽃은 한반도에 삼국시대부터 심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꽃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담긴 기록은 없다. 〈삼국유사〉와 〈고려사〉에 연(蓮)은 대부분 사찰 이름과 지명이며 실제적인 연꽃 내용은 〈삼국유사〉 8회, 〈고려사〉 2회다.
그러다보니 연(蓮)이 포함된 대부분의 어휘들은 불교와 연관돼 있다. 부처를 모신 감실인 연감(蓮龕), 불교를 의미하는 연교(蓮敎), 연방(蓮房·승방), 연화세계, 연화왕생 등 다양하다.
서긍이 저술한 〈고려도경〉에 연꽃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역시도 주목할 만하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사람들은 연근(蓮根)과 화방(花房)을 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족(佛足)이 탔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한다. 서긍의 언급을 통해 당시 송나라에서는 연근과 연밥을 식용했고, 고려인들은 식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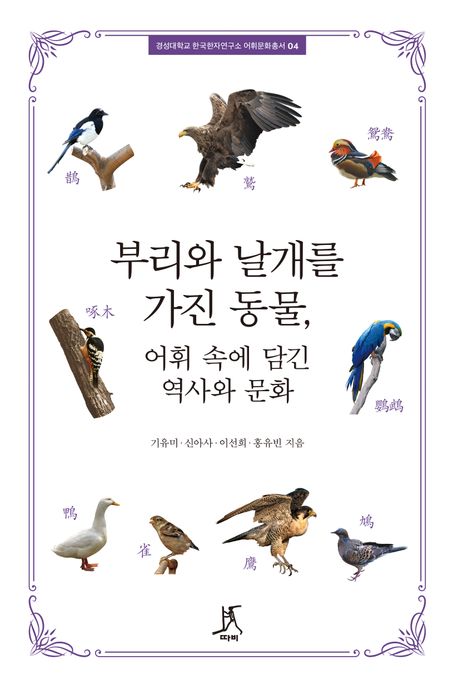
〈부리와 날개를 가진 동물,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서도 불교 이야기는 확인된다.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난다는 특징으로 인해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신성시되기도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조장(鳥葬)이다. 티베트 불교는 사체(死體)를 독수리 등이 먹음으로써 사자(死者)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어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다. 하늘을 날 뿐 아니라 물에 떠다니거나 잠수하기도 하는 오리는 천상계는 물론 지하세계와 교통하는 메신저로 여겨졌다.
작은 참새는 한국에서는 귀리를 가리키는 한자어 작맥(雀麥), 어린 찻잎을 따서 만든 작설차(雀舌茶)처럼 작은 것에 붙이는 이름이 되었는데, 일본에서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참새의 눈물에 빗대 ‘스즈메노 나미다호도노겟큐[雀の쎿ほどの月給]’로 표현한다. 동양에서는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기도 하고 반가운 손님이 오는 징조이기도 한 길조 까치는 서양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으로 취급받는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새였고 히브리 신화에서는 노아에게 홍수가 끝났음을 알린 비둘기는, 현재 한국에서는 닭둘기, 쥐둘기라고 불리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과 식물들의 어휘들을 살피면 인간의 삶과 관계를 맺어온 생명들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이 주는 재미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