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나는 영원한 것에 귀의한다
저자, 극심한 상기병앓아
삶은 고통과 괴로움 연속
비주류 머물며 삶을 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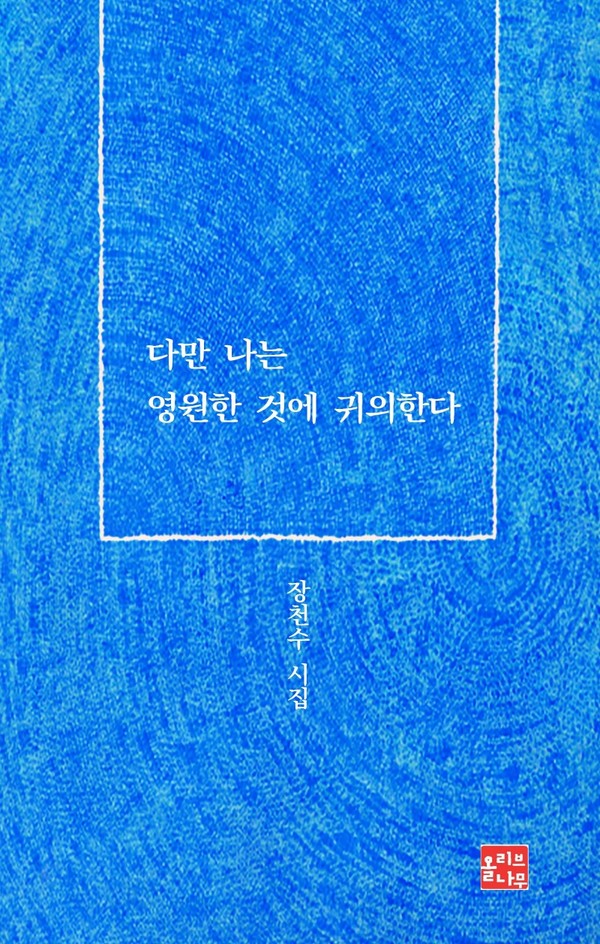
현대의학으로도 제대로 원인과 치유법을 밝히지 못한 극심한 상기증(강박신경증) 환자인 시인의 삶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는 듯한 일들이 다반사였다. 무어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는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늘 가위눌려 살아야 했다.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다 놓쳐버린 시인은 변두리에서 내내 비주류로 머물면서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배우기 시작한다. 영혼의 치유자인 인류의 스승 붓다와 대행 선사의 말씀을 치유의 비방으로 되새김질하며 운명처럼 시를 붙잡아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한(恨)을 풀어내듯 시를 써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닥치더라도, 텅 빈 마음으로 조금도 경황의 기색이 없이 이승의 골짜기를 건너고 싶다는 염원을 품은 시인이 고독을 날줄로, 그리움을 씨줄로 삼아 직조해 낸 ‘도(道)가 잉태하고 자라는 자리로서의 시편들이다.
선승들이 화두를 품고 살 듯이, 이제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의 모든 생명들에 대해 커다란 물음표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물음들은 시가 되어 그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 그의 인생 주조음이 된 고독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한다. “온 세상의 실상이 고독한 것임을/깨달음같이 내가 퍼뜩 보았을 때/그제야 고독은 내게 빙긋이 웃으며/바람처럼 한세상 지나가라 했고/물처럼 한세상 흘러가라 했고/구름처럼 한세상 떠돌다 가라 했네.”
세상의 방관자로서 그의 가슴에 자리잡은 고독은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불러오고, 그리움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그러기에 잡초들이 아스팔트 틈새에서, 쓰레기 널린 공터에서, 흙먼지와 매연을 뒤집어쓰고 “기를 쓰고 뿌리를 박고/기를 쓰고 잎을 피우고/ 기를 쓰고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희망을 보자고/무슨 영화를 보자고/무슨 빛을 보자고” 그렇게 기를 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한다. “생은 진실로/차별 없이 존엄하고/아무것도 버릴 게 없었다/그냥 숙연해졌다”(〈생은 진실로〉)라고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춤 추는 듯한 ‘뭉클함’을 토로한다.
세상의 어느 시인이 한 송이 장미꽃을 보고 ‘기적’을 노래했듯이, 시인은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피어난 꽃들을 보고는 “무슨 한(恨)들을 곱게 삭여 빚은 넋들”이냐고 느낌표를 표하면서, “봄은/해탈의 계절”(〈해탈의 계절〉)이라고, 지금 여기에 이미 무르녹아 있는 도(道)를 노래한다. 시인이 앞으로 더욱 더 지향하고 노래하고자 하는 바는 시편들의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다. 시인은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를 변용 인용하면서, “그러니 이제는/‘세상을 향한 독설을 거두고/내 손 안에 보이는 천하의 보물 쥐지는 못해도’/내 내면에 숨겨진 천하의 보물 지녔으니/빙긋한 미소로 천하의 보물 숨겨진/나의 내면을 주시하며 터덜터덜 가보자//그리하며 가다가 보면/내 내면에 숨겨진 천하의 보물과 불현듯 마주치며/틀이 바뀌고/꼴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서/‘산봉우리 저쪽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며/지혜와 자비의 양 날개로/하루 만 냥을 흩어 쓸 수 있는/신령스러운 독수리 되어 있을 게 분명할 게다’”(〈신령스러운 독수리〉)라고 다짐한다.
시인이 가리켜 보이는 “봄이 겨울을 밀어내는 노래” “고목에 꽃이 피는 노래”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노래” “쓰레기가 거름이 되는 노래” “아픔이 삭아져 힘이 되는 노래”(〈다시 시작하는 노래〉)는, 나와 너의 상대적인 구별이 없어져서 집착하여 취할 일이 없고, “일체 번뇌서 떠나 더 비울 게 없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세상의 주인공〉) 길 위서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대행 스님이 가리켜 보였던 주인공 자리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부리는 대상이 없이 텅 텅 비어 있는 주체이고, 주체라고 하지만 객체가 따로 없다. 그것은 시인이 “아프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사람이라서 내가 아파/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사람이라서 내가 외로워/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알아/너와 내가/따로따로가 아니고/모래알 모래알이 아니고/밥알 밥알이 모여서 된 밥덩이가 되어/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의 정을 떠먹이며/서로가 서로에게서 사람의 정을 떠먹으며 살며/달처럼/세상을 환하게/해처럼/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거다/나무처럼/세상을 싱그럽게/꽃처럼/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거다”라고 노래했듯이(〈사람은 그래야 하는 거다〉), 나와 너와, 나와 자연이, 나와 우주가, 하나로 통섭되는 한마당이다. 그 자리에서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따로 하지 않고, 찾는 자와 찾아지는 진리가 따로 하지 않는다. 진정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되찾게 될 때, 시간은 더 이상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지 않고 ‘영원한 현재’만을 노래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