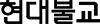불교와 유교의 인간형

추석 때 읽은 두 편의 단편소설
남들은 차례와 성묘, 고향 찾기로 분주했던 추석 연휴 때, 나는 남해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 찾아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야 할 고향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나흘 연휴를 집에만 있자니 좀이 쑤셨다. 남해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고향을 찾아온 친구와 친지들을 만나느라 바빴다. 외지 사람인 나로서는 끼어들기가 어려웠다. 그저 나를 무사히 사바세계에 살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마음으로 차례를 올렸다.
원효형 인간과 의상형 인간
개구쟁이와 모범생 구분 같아
자로·자공 등 공자제자도 달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무료하게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릴없이 지내자니 답답하던 참에 서가에 꽂인 책이 눈에 띠었다. 되는대로 뽑아 펼쳐보니 어느 이름도 낯선 출판사가 낸 단편 모음집이었다. 다섯 편의 단편소설을 모아놓았는데, 예전에 다 한 번씩은 읽은 작품이었다. 그 중 두 편에 마음이 갔다. 전광용 작가의 〈꺼삐딴 리〉와 안수길 작가의 〈제3인간형〉이었다.
오랜만에 두 편의 소설을 다시 읽었다.
두 작품의 주제가 같다 하긴 어렵지만 결국 사람이 상황에 대응하는 문제를 다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었다. 〈꺼삐딴 리〉는 의학박사 ‘이인국’이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 전쟁을 치르고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불어나던 시기를 살면서 요행인지 지혜인지 현실의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여 자신의 이익을 장악하는 이야기다. 이 소설은 1962년 7월 〈사상계〉라는 잡지에 발표되었다. 박정희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 쯤 지난 시점이었다.
안수길의 〈제3인간형〉은 1953년 6월 〈자유세계〉에 발표되었는데, 한국전쟁 휴전일이 그해 7월 27일 22시 이후였으니,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때였다.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작가 ‘석’과 대단히 도발적인 작가였다가 전쟁과 함께 사라지더니 돈 많은 사업가가 되어 나타난 작가 ‘조운’, 그리고 젊은 문학소녀 ‘미이’ 세 사람이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줄거리다.
‘이인국’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였다. 어쩌면 현실 적응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을 따지자면 불기둥 지옥에 가서도 에어컨을 돌릴 위인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21세기 현재의 한국사회에까지도 살았다면, 어떤 처세를 보였을까 궁금해졌다.
비관적이고 사색적인 성격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던 ‘조운’은 전쟁을 맞아 놀랍게 변신해 사업가로서 뛰어난 기질을 보여주었다. 한편 그를 문학적으로 흠모했던 ‘미이’는 처음에는 조운의 염세주의를 비판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장했다가, 전쟁 중에 끔찍한 일을 당한 뒤에는 세계관이 일변해 세상에 태어난 구실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성향이 바뀌었다. 이 둘의 변신을 보면서 이도 저도 아닌 나 ‘석’은 무엇인지 번민한다는 것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다.
두 편의 소설을 읽고, 문득 나 자신은 어떤 인간형인지 하는 의문과 함께 이 네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지도 궁금해졌다. 물론 읽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인물에게 손을 들 테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도 있을 테니 더는 언급하지는 않겠다.
눈[雪]의 결정만큼이나 많은 인간형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란 게 어쩌면 사람 수만큼이나 많을지도 모르겠다. 백인백색(百人百色)이고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그런데 이렇게 치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호사가의 짓궂은 장난인지 심리학자의 엄격한 구분인지 알 수 없지만, 인간형을 나눠보는 게 한때-아니면 지금도- 유행인 적이 있었다.
근래에도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구분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다. 사람의 활동력이 어느 때 가장 활발한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새벽에 눈을 떠 오전 중에 머리가 가장 팽팽 돌아가 창의적인 업무를 마치거나 활동양이 큰 사람이 전자일 게고, 해가 저물어야 엔도르핀이 돌기 시작해 새벽까지 활기차게 일을 끝내고는 동 틀 무렵 잠들어 낮이 되어서야 깨는 사람은 후자일 게다.
내가 보기엔 둘 다 정상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질 탓이든 버릇 때문이든 본인이 편하다면 따질 일은 아니겠다. 나라면 예전에는 아침형 인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에 졸가리가 없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알콜형 인간’과 ‘비알콜형 인간’도 있을 법하다. 술이 좀 들어가야 일할 맛이 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잔이라도 마시면 몸이 묵직해 만사가 귀찮아진다는 사람도 있다. 나도 술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술을 조금만 마셔도 글이 쓰이질 않으니 후자일 것은 틀림없다.
또 현실을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돈키호테형 인간’과 ‘햄릿형 인간’으로 나누기도 한다. 세상의 일에 대해 진지한 고민보다는 눈에 보이는대로 자기 기분대로 바로 부딪치며 해결해 나가는 저돌적인 인간도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하다가 제 스스로 자멸하는 번민형의 인간이 있는데, 각각 유명한 문학작품의 주인공 이름을 따 고안한 구분이다.
불교가 배출한 성현을 대상으로 구분해보면 어떨까?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섭형 인간’과 ‘아난형 인간’이다. 가섭존자는 인도 선종(禪宗)의 초조(初祖)로 불리는 두타제일(頭陀第一)의 인물이지만, 부처님과의 회합에-심지어 열반에 드셨을 때조차- 자주 지각을 한 것을 보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런데 아난존자는 다문제일(多聞第一)로 불릴 만큼 워낙 기억력이 좋았던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항상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니, 대단히 성실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속된 말로 ‘촉’이 좋은 분이었고, 아난존자는 ‘머리’가 좋은 분이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대덕(大德)을 들라면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나는 ‘원효형 인간’과 ‘의상형 인간’으로 나누고 싶어진다.
원효(元曉, 617-686) 스님은 선승인지 학승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에 못지않은 기행(奇行)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의상(義湘, 625-702) 대사와 함께 중국 유학을 가려다 간밤에 마신 맛좋은 물이 ‘해골 물’인 것을 알고 깨달음을 얻어 유학을 포기했다는 것이나,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을 깎으련다.(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고 외치고 다녀 요석공주(瑤石公主)와 염문을 뿌린 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비범한 행동으로 유명하다.
반면 의상 대사는 우리나라 화엄종(華嚴宗)의 개종조면서 화엄십찰을 건립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부석사(浮石寺) 창건과 얽힌 중국 여인 선묘(善妙)와의 로맨스가 있기도 하지만, 이 역시 ‘플라토닉 러브’에 가까운 미담이니, 원효와는 처신부터 달랐다. 괴팍했던 원효에게 제자가 붙어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의상에게는 물경 3천 명에 이르는 제자가 있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존경받을 행동으로 자신을 지켰는지 짐작이 간다. 스님은 강의와 수행에만 전력했으며, 가사와 병(甁), 발우(鉢盂) 세 가지만 지니고 다닌 청빈(淸貧)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면 불경하다는 핀잔을 듣겠지만, 원효가 ‘싹수가 남다른 개구쟁이’였다면, 의상은 ‘먼지 하나도 털어내는 모범생’이었을 듯하다.
공자 문하의 세 제자
공자 역시 제자를 3천 명이나 두었다니 별별 인간형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법석을 피웠을 것이다. 게을러 욕설까지 들어먹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우직하고 어리석었지만 이를 장점으로 살려 학문을 이룬 제자도 있다. 공문(孔門)에는 극과 극을 달린 제자들이 많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굳이 이들을 인간형으로 구분하라면 나는 ‘안회형 인간’과 ‘자로형 인간’, ‘자공형 인간’으로 나누고 싶다.
안회(顔回, 기원전 521-기원전 481)는 사색이 주특기인 ‘꽉 막힌 샌님’이었다. 무엇 때문에 공자가 안회를 그렇게 신뢰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이른 나이로 죽었을 때 공자는 남들 보기에 민망할 만큼 통곡했다고 한다. 햄릿처럼 행동보다는 고민에 치중했던 인물이라 별반 업적을 남긴 것도 없지만, 유가(儒家)에서는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다.
자로(子路, 기원전 543-기원전 480)는 실천력이 아주 강했던 인물인데, ‘의리의 돌쇠’ 같은, 언행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다. 공자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지만, 공자의 결행에 어깃장을 많이 놓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로가 비참하게 죽자 그 충격으로 공자 역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이 귀여운 악동(?)에게 공자도 애정을 가지기는 했던 모양이다.
자공(子貢, 기원전 520?-기원전 456?)은 전형적인 책사형(策士型) 인물이었다. 언변이 뛰어났던 데다 외교관으로서도 수완을 보였고, 무엇보다 이재가(理財家)로서 재산을 많이 모아 공문의 번영은 그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한다. 비교적 장수를 했고, 공자가 별세한 뒤 공문의 실질적인 계승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유가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 자로였다는 생각이 든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 말 많고 탈 많은 속세에서 갑자기 삭발(削髮)에 열을 올리는 중생들이 확 늘어났다. 불문(佛門)에 귀의하고자 하는 기특한 사람은 아닌 듯하고, 느닷없이 만인좌시리(萬人坐視裏)에 티브이로 중계가 되면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못 깎아 안달인 사람이 많으니, 앞으로도 이 불사(佛事)에 동참할 이들이 줄을 설 것으로 보인다. 훗날 이런 분들을 두고 사람들은 어떤 인간형이라 시호(諡號)할지 참으로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