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와 공자, 그리고 우리들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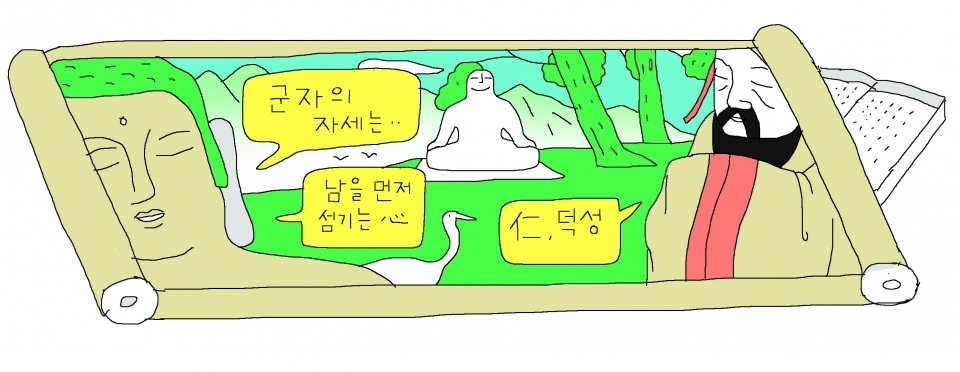
새로움과 만남, 그리고 공동체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고작 하루 차이, 아니 일 초의 간격에 지나지 않는데도 기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사람이 멋대로 나눈 시간일 뿐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울림을 느낀다. 강물이 굽이치며 울려야 그 존재를 주목하듯이 시간도 굽이칠 때가 있어야 그 시간의 의미를 응시하게 되는 듯하다.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무엇을 지표로 삼아 살아야 할지 되새기게 된다.
지루하고 번잡했던 서울 생활을 털어버리고 경남 남해군에 내려온 지도 일곱 해째가 된다. 그 새 여러 일이 있었다. 책을 몇 권 냈고, 진주교육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고, 이사를 몇 차례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쓴다. 다 시절인연이 닿아 거둔 수확이겠다.
남을 편하게 하려는 ‘佛心’
공자가 설한 ‘仁’과 맞닿아
“깨달음 씨앗 쟁기질 하자”
따져보면 지난 여러 해 동안 했던 나의 일이란 게 ‘만남’이란 말로 수렴되는 듯하다. 책을 통해 독자를 만나고, 강의를 통해 학생을 만나고, 이사를 해서 이웃을 만나고, 글을 통해 도반(道伴)을 만난다. 다 좋은 만남이랄 수는 없지만, 만남은 어쨌거나 이로운 일이란 생각이 든다.
인연이란 참 소중한 것이라서, 내가 좋다고 마냥 만날 수도 없고 싫다고 아예 안 볼 수도 없다. 이래저래 버거운 일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다”고 설파했는가 보다.
우리는 한 평생을 살면서 몇 명의 사람이나 만나게 될까? 지구상의 인구가 6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 우리는 기껏해야 천 명도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우러지며 살다 죽는다. 당장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 명단을 헤아려보라. 천 명은 고사하고 그 반도 안 된다. 게다가 이름을 보고도 누군지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만나 안다는 일이야말로 고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만남에 대해서는 공자도 〈논어〉 ‘술이편’에서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그 안에 반드시 스승 될 이가 있다. 착한 사람은 본받아서 스승이고, 못된 사람은 내 허물을 고칠 수 있으니 스승이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의 반은 선인(善人)이고 반은 불선인(不善人)이라지만, 내가 선인을 많이 만났다면 전생에 많이 쌓은 적덕이 베푼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남을 보면서 얻는 경험이요 판단이다.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은 분명한데, 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도리는 없다. 내가 있어 남이 있듯이 남이 있어 내가 있다. 시야를 바꿔 남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둘러보자. 나는 과연 남에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선인’인 것일까? 참으로 섬뜩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새해는 해도 새롭지만, 나도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다잡는다. 어쩌면 인간은 일생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초 매시간 다시 태어나는 존재일 듯도 하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한갓 미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부처 또한 매한가지일 것이다. 미물과 부처도 찰나의 순간마다 다시 태어나 스스로를 새롭게, 새롭게 갈고 닦으리라. 그리하여 미물도 부처가 되고, 부처는 더욱 큰 부처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부처와 공자는 어찌하여 위대할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명을 받아 처음 태어날 때 외쳤던 일성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 우주 위와 아래에서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는 선언이다. 이 말에 이어 석가모니는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즉 “온 세상 중생들이 다들 괴로움 속에 놓였으니, 내가 마땅히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는 말도 남겼다. 이 말은 이생에서의 석가모니가 한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전생인 비바시(Vipassi, 毘婆尸) 부처의 일화에서 나온 것이라는데, 중국에서 경전이 한역되는 과정에서 와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 역시 항상 새로 태어나는 존재로 본다면 그것이 어느 때인들 무슨 상관이랴.
나는 이 말을 되새길 때마다 첫 번째 두 구절만 기억하고 이어지는 두 구절은 덮여버린 것이 아쉬웠다. 석가모니는 ‘나’의 소중함을 역설하면서 남과 함께 어깨를 비비며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다. 자리행(自利行)과 이타행(利他行)은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인 것을 자각하라고 죽비로 등짝을 세게 내리치면서 베푼 가르침이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참다운 나로 존립할 수 있음을 반추하도록 이끈 말씀이었다.
〈장아함경(長阿含經)〉에는 첫 발성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실려 있는데,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은 뒤 “천상천하 유아위존 요도중생 생로병사(天上天下 唯我爲尊 要度衆生 生老病死)”, 즉 “이 우주 위와 아래에서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오로지 중생들을 생로병사의 질곡에서 구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큰 차이는 없는 발언이지만, ‘고(苦)’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타산적인 중국인다운 번역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는 모두 학교를 다녔을 것인데, 학교마다 교훈이란 게 있다.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교훈은 배재중학교의 교훈인데(내 동생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로 기억한다. 가장 편한 우리말로 가장 깊은 진리를 담았다. 석가모니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서 부처가 된 것은 아니다. 남을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이를 실천했기에 부처가 된 것이다.
공자에게 있어 이런 부처에 해당하는 존재가 있다면 군자가 아닐까? 〈논어〉에는 이 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장광설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공자는 세상의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 보는데, 성현(聖賢)과 군자, 그리고 소인(小人)이다. 계층이 아니라 인격을 바탕으로 삼은 구분이다. 〈계씨편〉에서 공자는 성현(원문은 ‘上’이다)은 “나면서부터 아는 이(生而知之者)”라 했고, 군자(원문은 ‘次’)는 “배워서 아는 이(學而知之者)”라 했으며, 소인(원문은 ‘下’)은 “답답해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이(困而不學)”라고 규정했다. 내가 조금 고쳐 푼 것이지만, 대의에서 큰 다름은 없을 것이다.
군자로만 국한해 더 살펴보면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는(過則勿憚改)”(〈학이편〉) 사람이라 했고,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뤄주지만 남의 악함을 이뤄주지는 않는다(成人之美 不成人之惡)”고 했다.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데에도 적극적이지만, 남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데도 소홀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공자는 그것을 인(仁)에서 찾았다. 인이란 남을 위해 발현하는 덕성(德性)이다. 인을 가장 잘 설명한 말로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말을 첫손가락으로 꼽는다. 나도 싫고 남도 싫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나, 즉 군자가 하라는 말이다.
석가모니는 나면서부터 나의 존귀함과 남의 소중함을 깨치셨으니 성현이고, 공자는 뒤늦게 공부하여 도를 알았으니 군자로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위정편〉에 보면 공자는 열다섯이 되어서야 배움에 뜻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석가모니도 인간이라면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서야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생에서 배움의 길을 거친 셈이다. 그 깨달음의 씨앗은 부처나 공자나 모두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 부처가 되고 공자가 되자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교화해 구제하려 했던 보살의 태도나 치군택민(致君澤民)하려 했던 군자의 지향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과 공자의 가르침에서 출발했다. 세상의 제도나 논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이 달라질 리는 없다. 한 송이 꽃에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과 공자의 가르침을 알곡을 고르듯이 낱낱이 읽고 이를 꼼꼼히 실천한다면, 그 안에서 연화장세계와 대동세상은 빛나게 결실을 맺을 것이다.
새해를 맞는 아침에 우리들은 첫 날 떠오르는 해를 만나려 집을 나서 먼 길을 떠난다. 탁 트인 동해 바다에서 파도를 가르며 솟아나는 해를 품기도 하고, 하늘과 닿을 듯 높은 산봉우리에서 운무 속에 춤추며 떠오르는 햇살의 기운을 마시기도 한다. 나 역시 남해에 살면서 이따금 새해를 반기려고 남해의 영산 금산(錦山)에 오르곤 한다. 보리암에서 만나는 해는 부처님의 넉넉한 미소만큼이나 은은하게 오래도록 마음을 적신다. 더욱이 올해는 새 글을 써서 새 도반들과 새로 길을 여는 시작이다.
우리들이 해를 찾아 새벽 밤길을 더듬는 일은 마치 미망(迷妄)의 어둠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모색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말씀, 공자와 그 훌륭한 계승자들의 언행을 밭을 갈 듯 쟁기질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 글이 그런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세모가 왔을 때 우리가 부처의 터전에 성큼 다가와 있고, 공자의 울짱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선뜻 왔음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소설가〉

임종욱 소설가는
1962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5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2012년 김만중문학상에서 〈남해는 잠들지 않는다〉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남해에서 창작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진주교육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작문을 가르치고 있다. 불교 저서 〈우리 고승들의 선시 세계〉와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여러 편의 선시 관련 논문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