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1〉
법이나 본심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법·마음 전하는 바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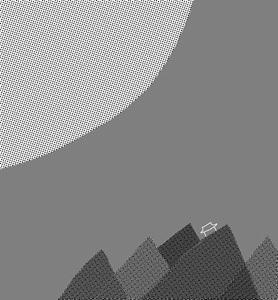
전하는 도리를 알게 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
하나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곳
진정한 도량임을 알면,
어디를 가나 걸음걸음마다
연꽃 피는 정토가 된다
불법은 있다, 없다는
상대적 개념 붙일 수 없는 것
미혹도 없고 보리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 다함도 없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약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는 것’이 된다.
말할만한 어떤 법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 곧 〈금강경〉 ‘사구게’에서 사도(邪道)라고 이른 ‘음성으로써 부처님을 찾는 것’이 된다. 음성이든 뭐든 일체가 부처 아닌 것이 없는 줄 알면 그만이다. 나중에는 부처든 마구니든 싸잡아 내동댕이칠 수 있어야 한다. 흔적 없이 싹 쓸어버리는 것이 선(禪)의 본령이다. 내가 있다는 견해를 내면, 곧 처소(處所)의 한정이 있게 된다. 법 또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법이란 바로 마음이다.
내가 있다거나 법이 있다고 한다면, 곧 나라고 하는 것 혹은 법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어디에 머물게 된다. 불법은 머무는 바가 없어서, 육조스님께서도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나든 법이든 온통 한마음이어서, 달리 다른 무엇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마음법을 부촉하노니 법, 법 하지만 어찌 법이 있을손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 마음, 마음 하는 법을 비로소 알리라.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열반묘심을 전할 때, 실제로는 한 티끌이라도 전한 바가 없다. 본래 다 갖추어진 것을 스스로 자각 하게 해준 것일 뿐, 달리 더하거나 덜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일체 중생이 스스로 완벽하게 갖추어 쓰고 있는 마음은 부처라고 해서 더 많이 가지고, 중생이라고 해서 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전하고 받고 하는 법이나 본심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을 전하는 바 없이 전하는 도리를 알게 된다. 이것이 역대 불조께서 열반묘심을 이심전심으로 전한 바이다. 다만 범부는 이 말을 배워서 따라하려 하지 말고, 묵묵히 계합하여 흔쾌해지도록 정진해야 한다. 위의 게송에서 앞의 두 구절은 석존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실 때 전법게의 일부이다. 뒤의 두 구절은 서천 4조와 6조의 게송에서 따온 말이다.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도량에 앉는다고 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 뽑는 선불장(選佛場)이란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장소다. 일체 시비와 사량 분별이 끊어진 진리의 도량인 것이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런 도량에 앉아 계신다. 그곳에는 비록 허망한 것들이 와도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청정해진다. 마치 허공에는 한 물건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참된 공부인이라면 늘 그런 도량에 앉아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을 잘 살펴 쓰면서, 모든 대중을 공경하고 원만하며 편안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한 가지 법도 얻을 수 없는 곳이 진정한 도량임을 알면, 어디를 가나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는 정토가 된다. 그런 사람에겐 예토(穢土)가 곧 정토다. 당당하고 무애자재한 대자유인의 삶이 펼쳐진다.
법이 본래 공(空)임을 깨닫는 것을 공여래장(空如來藏)이라 한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낄까?’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면, 유유자적하게 소요할 뿐 다시 무슨 말을 하랴.
내면의 청정도량이 밝아지면, 그곳에는 제도할 중생이라곤 하나도 없다. 법은 본래 공해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담담하고 청량한 기운으로 그저 인연 따라 임운등등 흘러가면서, 이런 소식을 알게 해주신 불법의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렇게 공부가 더 깊고 넓어져 가는 것이다. 아마 배휴거사도 황벽스님의 단련을 받고, 만년에는 유유자적 소요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배휴거사의 묘소는 위산에 있다. 황벽스님이 돌아가신 뒤, 당대의 선지식인 위산스님에 의지하여 만년을 보냈던 것이다. 황벽과 위산은 둘 다 백장의 제자로서, 사형사제 간이었다. 위산의 법은 앙산으로 이어져 위앙종을 이룬다.
배휴가 물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한 물건도 없음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낄까?’ 하는 육조스님의 유명한 게송은 신수스님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자.’는 게송에 대응해서 한 말이다.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유위(有爲)의 입장에서 뭔가 노력하려는 신수스님의 입장에 대해,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무위(無爲)의 도량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수스님의 견해에 상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 아직 ‘무일물(無一物)’의 ‘없다’는 흔적이 남아있다. 육조스님은 그 후 오조 홍인스님께서 따로 불러서 〈금강경〉을 설해주는 인연에 힘입어, ‘있고 없음’의 상대적인 없음마저도 싹 지워버렸다.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깨달음이란 옳은 곳도 없으며, 그렇다고 앎이 없는 것도 없다.”
육조의 법을 잇게 되는 남악회양(南嶽懷讓) 스님이 스승을 참배한 자리에서 “어떤 물건이 왔는고?” 하는 질문을 받고, 8년간 궁구한 끝에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고 대답하여 인가를 받았다. 불법은 있다, 없다는 상대적 개념이 붙을 수 없는 것이다. 미혹도 없고 보리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