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깨달음과 닦음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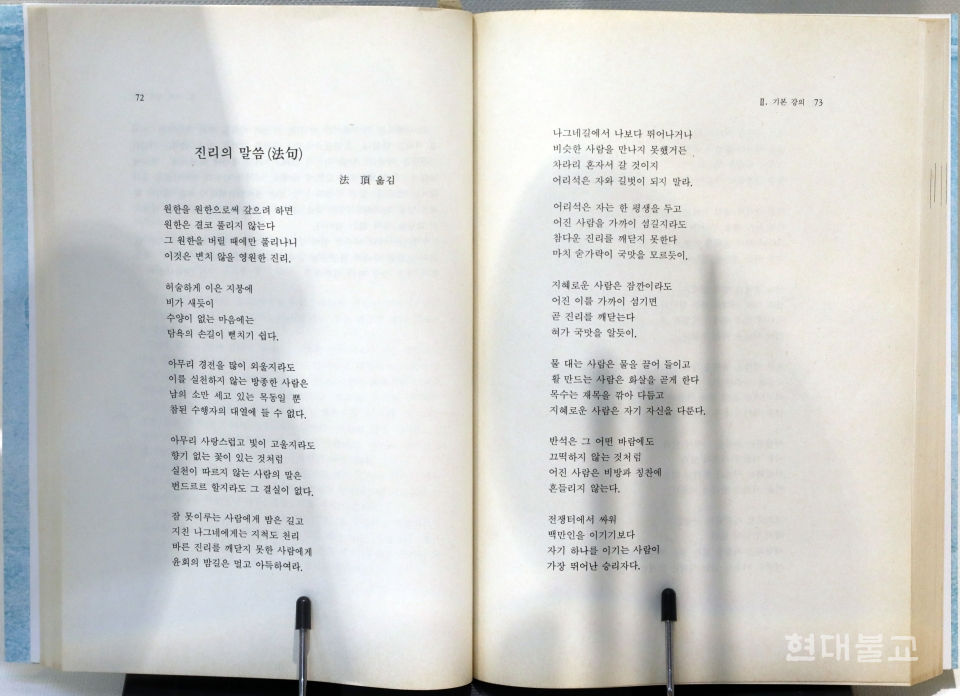
“깨달음과 닦음에 완성이 있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제품이라면 완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세계에 있어서 완성이란 우리가 두고두고 들이 캐야 할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1990년 절집 안에서 돈오돈수가 옳으니 돈오점수가 맞느니 하며 입씨름이 한창일 때 법정 스님이 ‘깨달음과 닦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에서 남긴 말씀이다.
닦음은 ‘거듭 행함’ 의미
자비실천행은 끝이 없다
마음을 닦아 자성 성불을
1981년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를 펴내면서 돈오점수가 “틀렸다!” 외치면서 이른바 돈점 논쟁이 불붙는다. 성철 스님은 돈오점수는 알음알이(知解)로 지어낸 잘못된 수행이론으로 깨달음을 이끌지 못할 뿐 아니라 외려 걸림돌이 된다면서 돈오점수 사상을 따르는 이는 다 지해종도이며 이단사설에 홀린 사람들이라고 드잡이한다. 깨침과 닦음이 점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완성된다는 말씀으로, 헤아려 알고(解悟) 나서 닦는다(漸修)는 것은 뚜렷이 아는데(證悟) 이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1987년 보조사상연구원 초대 연구원장을 맡은 스승은 〈보조사상〉 창간호 머리말에서 돈오점수를 이렇게 말씀한다.
“교단 일각에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아직도 보조의 돈오점수 사상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종교 근본은 공허한 말끝에 있지 않고 투철한 체험과 실지 행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불타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은 돈오이고, 45년 동안 많은 중생을 제도한 일은 점수에 해당한다. 이것이 또한 불교 두 날개인 지혜와 자비의 길이다.
깨달은 다음에 하는 수행은 오염을 막을 뿐 아니라 온갖 행을 두루 닦아 스스로와 이웃을 함께 구제하는 일이다.
보조 스님은 〈절요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즘 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흔히 말하기를 불성을 바로 깨달으면 이타의 원이 저절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성을 바로 깨달으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여 나와 너의 차이가 없어진다. 이때 비원을 발하지 않으면 적정에 갇힐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화엄론에 이르기를 지성(智性)은 정하므로 원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깨닫기 전에는 비록 뜻은 있어도 역량이 달려 그 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차별지로써 중생의 괴로움을 보고 대비원을 발하여 힘과 분수를 따라 보살도를 닦으면, 깨달음과 행이 가득 채워질 것이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는 돈오점수를 자신 형성과 중생 구제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알아야 바로 행할 수 있고, 그런 행의 완성이야말로 온전한 해탈이요 열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불교가 요즘엔 초기 불교와 석가모니부처님 가르침을 내세워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승불교를 내걸며 선불교를 으뜸으로 꼽았던 한국불교에서 나눈 가르침은 대부분 달마 스님을 비롯한 중국 조사들 이야기였다. 그러나 스승은 일찍부터 석가모니부처님 말씀을 줄기로 세워, 〈화엄경〉을 바탕에 두고 가르침을 펼쳤다. 그런 스승이기에 깨달은(돈오) 부처님이 50년 세월을 이 마을 저 마을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널리 사랑을 펼쳤다(점수)고 푼 것이다. 스승은 ‘깨달음과 닦음’에서 거듭 말씀한다.
“한꺼번에 단박 깨닫고 단박 닦는다, 또는 더 닦을 것이 없는 깨달음.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삶의 진실에서 벗어나 있다. 불교란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깨달음과 닦음으로써, 또는 지혜와 자비로써 몸소 부처를 이루는 길이다.
교조 불타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도 그전이나 다름없이 한결같이 닦음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닦음을 어떻게 일시에 마칠 수 있단 말인가. 닦음(수행)이란 말 자체가 어느 한때 한꺼번에 해 마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익히고 행함으로써 무한히 형성되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또 무수한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이 지은 업은 그만두고라도, 종교 기능인 사회를 아우르는 의무와 나누어 가짐에도 끝이 없는데 수행 완성을 어떻게 일시에 이룰 수 있겠는가.”
스승과 성철 스님은 깨닫고 닦음을 받아들이는 결이 이토록 달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철 스님은 돈오돈수 사상을 담은 〈선문정로〉를 펴내면서 이토록 결이 다른 스승에게 원고를 다듬어 달라면서 상좌 원택 스님을 스승에게 보낸다. 스승은 “스님께서 소중한 책을 내게 보라고 보내셨으니, 어미 하나까지도 어른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니까 내 글처럼 쉽사리 고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는 원택 스님과 같이 두 달을 넘기며 글 다듬기를 마친다. 출간을 앞두고 스승은 원택 스님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
“불교 출판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까닭은 법공양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스님 책이라도 값을 매겨서 시중에 내지 않고 법공양만 하고 마니까 책이 나와도 절 안에서만 돌다가 이내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정가를 붙여서 내면 잘 팔리면 십 년이고 백 년이고 팔리는 날까지 그 책이 살아남아 있지 않으냐. 그러니 성철 스님께 말씀드려서 법공양을 하지 말고 시중서점에 내놓아 팔도록 하라.”
당시 불교 출판계에서는 부처님이 펴신 가르침이 담긴 책을 돈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원택 스님은 값을 매겨 내놓도록 하자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책은 내 돈 들여 찍어 나눠주는 것”이라며 역정을 내는 성철 스님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말씀드려 〈선문정로〉을 시중서점에 내놓는다.
어떻게 스승은 당신 뜻과 결이 다른 이 책이 널리 퍼지도록 법공양을 하지 말고 값을 매겨 내놓으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스승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원택 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른들은 품이 다르면서도 같다고 생각했다. ‘다름’과 ‘닮은’은 본디 한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낱말이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을 보고 틈이 벌어졌다고 여기는 이는 다르다고 하고, 가까이 있다고 보는 이는 닮았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두 어른이 품은 결은 아주 다를까?
나는 성철 스님이 어떤 데 뜻을 두고 ‘돈오돈수’를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한다. 뵌 적도 없고 공부도 모자라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스승과 나눈 이야기를 담은 〈설전〉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다가서 본다.
성철 스님이 1967년 백일법문을 하실 때 스승은 성불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다. 성철 스님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 모두가 자기 마음을 깨쳐서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지, 언어와 문자에 의지해서 도를 얻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다. 밥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배가 부르지 않고 밥을 먹어야 하듯이,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자성을 깨쳐야 성불할 수 있지 언어와 문자로는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팔만대장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되묻는 스승에게 성철 스님은 금강산이 아무리 좋기로 그것을 알리는 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금강산이 좋은 줄 알겠느냐? 〈팔만대장경〉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팔만대장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니 대장경에 매이지 말고 스스로 자성을 깨쳐야 한다고 말씀한다. 아울러 “오직 우리 불교라는 것은 자성을 깨친 데서 자기의 이익이 있고(자리) 자성을 깨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남에게 이익을 크게 주었다는 것(자타)이다. 언어와 문자는 실제로 이익을 주기 어렵고 중생제도를 잘할 수 없으니 자기 마음을 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
스승은 1982년 성철 스님과 대담에서 〈선문정로〉 출간에 힘입어 우리나라 선문에 바른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나누면서 젊은이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느냐고 여쭌다. 성철 스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은 “일체가 다 절대이니 거기서 모든 상대를 부처님같이 섬기자, 스승같이, 부모님같이 모시자고,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젊은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아울러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란 없다. 구원이란 불쌍하고 못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냐? 불공이란 저쪽이 부처님이기에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가 배고픈데 불쌍해서 밥을 가져다준다면 큰일 날 소리”라고 하면서 “절은 불공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 하는 곳이 아니다. 탁자에 앉아 있는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서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모시도록 (불공을) 가르치고 있다”라 말씀한다.
스승도 저만 아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찾아온 어느 부인에게 “마음이니 부처이니 중생이니 하지만 뿌리로 들어가 보면 다르지 않다. 그러니 부처와 보살을 밖에서 만나려 말고 집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시들해진 사이가 새로운 활기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한다.
두 스승이 나눠준 말씀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가까운 두 어른 결이 어째서 깨달음과 닦음에서는 그토록 멀리 서 계실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