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전참묘(南泉斬猫)와 불문마(不問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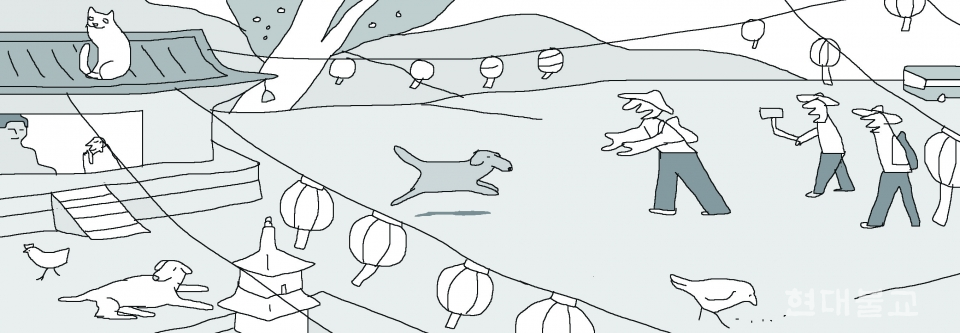
내가 사는 남해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유기동물을 입양하라는 공고가 자주 눈에 띤다. 누군가 버렸거나 떠도는 동물을 군에서 포획해 보호하면서 애완동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입양해 기르라는 뜻이다. 매주 거르지도 않고 공고가 나는 것을 보면 동물이 꽤 많이 버려지거나 방랑하는 모양이다.
불교는 만물실유불성 근간
마음수행의 방편으로도 활용
짐승목숨·사람목숨 같아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다 알다시피 이렇게 잡힌 동물들은 일정 기간 입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킨다. 얼마 전 어떤 동물보호협회 대표가 기부금을 받아 챙기고는 동물들을 대량 살육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동물을 도구로 생각하고 이익만 챙기려는 인간의 더러운 생리가 빚은 비극이다. 어쨌거나 이런 파렴치한 행동과는 다르지만 많은 동물들이 애꿎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어떤 조물주가 동물을 살육하거나 안락사해도 좋다는 권리를 인간에게 주었을까? 공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아 한 마리 분양받을까 생각하지만, 우리 집은 이미 동물로 포화 상태다.
나도 남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개와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에서 한방에서 놀고 잔다. 딸아이들이 워낙 동물을 좋아해, 개는 길에서 떠도는 놈(암컷이다!)을 데려오더니, 작년 초에는 갓 낳은 수컷 고양이 새끼를 분양받아 데려왔다. 견묘지간(犬猫之間)이란 말은 없으니 둘이 원래 사이는 나쁘진 않은가 본데, 그래도 같이 기를 때는 싸우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처음엔 데면데면하더니 이제 일 년이 지나 얼굴을 익혔는지, 으르렁거릴 때도 있지만 큰 다툼은 없다. 동물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인간은 끝없이 서로를 괴롭히니,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만물실유불성(萬物悉有佛性)을 교리로 삼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살생을 금하고 있고, 수행자는 아예 육식조차 못하도록 못 박아 두었다. 미물이라도 해치지 않고자 스님들이 주장자를 든 이유가 땅에 사는 벌레가 인기척을 느끼고 피하라는 뜻이라니,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데 이런 배려를 하는 종교는 많지 않을 듯하다. 부처님의 생명 사상이 부디 빨리 세상에 퍼지기만 빌 뿐이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 그것도 권력층 중심의 지배 사상이 확고한 유교에서 동물에 대한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다. 애완동물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함께 했으니, 공자가 살던 고대 중국에도 애완동물이 없진 않았을 터인데, 〈논어〉에 개(犬)는 등장하지만 견마(犬馬)라 하여 가축의 개념이 강하다. 고양이(猫)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인(仁)을 강조했던 공자가 동물에 대해 무심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에서 동물은 어떤 존재로 형상화되었는지 궁금해졌다.
고양이도 살리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꿈꾸는가?
비유담이 넘쳐나는 불교 경전에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우화(寓話)가 없진 않겠지만, 우선 손에 집히는 대로 화두집 〈벽암록(碧巖錄)〉을 펼쳐 들었다. 모두 100칙의 공안(公案)이 실린 이 책을 일별만 해도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브라가 나오는가 하면(제22칙, 설봉의 코브라(雪峰鼈鼻蛇)) 쇠붙이소(鐵牛)도 나오고(제38칙, 풍혈이 설법하기를 “조사의 불심인은 쇠붙이 소와 같다(風穴祖師心印)), 금빛 물고기(金鱗, 제49칙)와 들오리(野鴨子, 제53칙), 고라니(闖, 제81칙), 호랑이(虎, 제제85칙), 무소(犀子, 제91칙) 등이 당장 눈에 띤다.
그러나 〈벽암록〉에 나오는 동물 가운데 압권은 역시 고양이다. 제63칙에 나오는 남천 선사가 새끼 고양이를 베어버린 공안이다. 벌레도 죽이지 말라는데 대선사가 고양이의 목을 베어 버렸다니, 분위기도 섬뜩하지만 무슨 망발인가 싶을 만큼 괴이한 사건이다. 본문을 그대로 보자.
남전산에서 어느 날 양당의 중들이 새끼 고양이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남전 화상이 보다 못해 그 새끼 고양이를 번쩍 집어 들고는 “누구든 한 마디 해보라. 그러면 살려 주겠다(만 그렇지 못하면 단칼에 베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중이 없었다. 남전 화상은 새끼 고양이를 두 토막으로 잘라 버리고 말았다.(擧 南泉一日 東西兩堂 爭猫兒 南泉見 遂提起云 道得卽不斬 衆無對 泉 斬猫兒爲兩段)(번역과 원문은 안동림 선생의 역주본 〈벽암록〉(현암사, 2008)을 인용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잘 된 번역이라 생각한다.)
절을 다니다 보면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곳이 의외로 많다. 깊은 산중에 있으니 무료하기도 하겠지만, 산중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편도 있을 것이다. 반갑게 꼬리 치며 다가오는 개나 마루에서 햇볕을 쬐며 느긋하게 잠이 든 고양이를 보면 깨달은 자의 다른 모습을 보는 듯해 기분이 야릇해진다.
아직 수양이 깊지 않은 스님들이 새끼 고양이가 귀여워 서로 자기 방에 두겠다며 다툰 모양이다. 집착을 털지 못한 선지식의 망동에 눈살이 찌푸려진 남전 화상이 한 마디 말만 제대로 하면 살려주겠다면서 스님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고, 새끼 고양이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남전은 무슨 말을 기대했던 것일까? “제발 고양이를 살려 주세요.”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뻔한 뇌까림을 들을 작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그 말을 찾아보라는 것이 이 화두의 핵심이겠다. 그런데 다음 64칙에 해답이 나와 좀 싱겁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마침 출타중이어서 그 새끼 고양이 소동 때 없었던 조주가 저녁에 돌아오자) 남전 화상이 낮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조주에게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다.
곧 조주는 두 말 없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가 버렸다. 남전 화상이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새끼 고양이를 구했으련만” 하고 뇌까렸다.(擧 南泉 復擧前話 問趙州 州 便脫草鞋 於頭上戴出 南泉云 子若在 恰救得猫兒)
해답이라지만 이 또한 해괴하기 짝이 없다. 짚신을 머리에 이고 나간 것이 어떻게 대답이 되는가? 더구나 이것은 남전이 요구한 ‘한 마디 말’도 아니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다투던 스님들은 고양이에게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말’에도 집착했다. 무슨 말을 해야 고양이를 구할까 고민하면서 그 ‘말’을 찾았을 것이다.
생명을 구할 말이니 쉽게 입이 떨어질 리 없다. 내심 ‘설마 죽이겠어.’ 하는 안이한 요행심도 있었겠다. 말을 하라고 하니, 말에 집착해 오도 가도 못하는 꼴에 철퇴를 내려버렸다.
스님들이 얼마나 경악했겠는가? 그래도 깨닫지는 못했다.
조주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선기(禪機)라면 따를 자 없던 조주였다. 말 따위에 집착하는 조주가 아니었다. 사실 짚신을 머리에 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무언가를 함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난 자기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설사 조주가 남전에게 침을 뱉거나 나아가 뺨을 철썩 보기 좋게 때렸더라도 남전의 대답은 같았을 것이다.
남전이 든 칼은 활인검(活人劍)이었으니, 조주의 대답에서 죽은 고양이는 다시 살아났을 게 분명하다. 아니면 아예 집착에 눈이 먼 스님들이 허깨비를 본 것일 수도 있다. 고양이를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만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애완묘(愛玩猫)가 보여주었다. 새끼 고양이여, 거룩하고 거룩할진저!
마구간에 불이 나면 누가 위험한가?
동물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던 공자였지만, 동물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하나 〈논어〉에 나온다. 10편 향당편에 있다. 역시 본문을 읽어보자.
마구간에 불이 났다. 스승께서 조정에서 퇴근하고 오시더니 “사람이 다쳤느냐?”고만 물어보실 뿐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으셨다.(廐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
고대 중국에서 말은 소만큼이나 중요한 가축이었다. 소는 농사에 필요하고, 말은 전쟁이나 위엄을 과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특히 관직에 있는 이라면 말이 끄는 수레를 타는 게 기본이었다. 공자도 한때 조정에서 관직을 한 몸이라 집에서 말을 길렀던 모양이다.(아니면 남의 집 마구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구간에 불이 났으니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귀가한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이 다쳤는가만 묻고 말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는 소리다.
그런데 마구간은 말이 사는 곳이 아닌가? 거기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사람의 안위만 걱정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똑똑하기로 한 가닥 했던 주자(朱子)는 이 구절에 대해 “인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축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치에 마땅하다고 해설했다. 참으로 얄밉고 비정한 소리다.
조선시대의 유학자인 윤휴(尹?, 1617-1680)는 꽤나 진보적인 색채를 띤 유학자였다. 〈논어〉의 이 구절과 주자의 해설을 접한 그는 아무래도 뭔가가 찝찝했다. 사람도 소중하지만 말도 생명인데, 어찌 묻지 조차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논어〉 원문의 구두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傷人乎 / 不問馬”로 끊지 않고 “傷人乎不 / 問馬”로 끊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렇게 끊으면 뜻이 “사람이 다쳤는지 아닌지 묻고 난 다음에 말에 대해 물으셨다”가 된다. 이런 해석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공자답다.
윤휴는 나중에 역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유배를 갔다 처형당했는데, 공자보다 주자를 맹신했던 조선시대의 답답한 유학자들은 윤휴를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며 맹비난했다고 한다. 말만도 못한 인간이 예나 제나 많은가 보다.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짐승의 목숨도 고귀하다. 짐승의 목숨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인간은 사람의 목숨도 하찮게 본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청소가 왜 일어났겠는가? 오늘부터라도 지나가는 떠돌이 개나 고양이가 보이면 먹이라도 좀 주고 그래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