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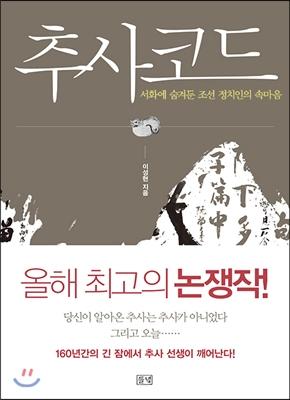
괜한 어깃장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또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시초는 우리 서화에 대한 기존 해설의 빈약함과 왜곡서 출발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며 현란한 용어를 구사하는 해설가들 앞에서 일단 고개를 끄덕였지만, “알게는 된 것 같은데 뭐가 보인다는 걸까?” 하는 내면의 의구심은 잠재우지 못했다.
현역 화가인 저자는 한국화,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동양화에 대해 큰 의문을 품었다. 우리 그림은 왜 이리 단순한 표현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르는, 표현상의 어떤 암묵적 제약이 있기 때문일까? 반대로, 혹시 그 제약이란 것이 어떤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서화들을, 특히 진경산수화가 등장하기 전후의 서화들을 읽어내면서 저자는 일종의 벽을 느끼게 됐다. 이를 풀기 위해 그림 자체뿐 아니라 주류 성리학과 비주류 실학 및 고증학, 아울러 당대의 정치적 맥락 등을 꼼꼼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저자를 감춰진 비밀을 추적해 들어가는 탐정(?)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저자는 추사에 집중했다. 추사가 살던 시대는 세도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다. 정조가 승하한 후 자기 아버지 세대서 조선 실학의 꽃망울이 꺾이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성장한 추사는 실학의 씨앗 격인 고증학에 눈을 돌린다. 배움의 최종 목표를 ‘치국평천하’에 두는 유자(儒者)라면 마땅히 자신의 배움을 세상의 밝은 도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배우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조선의 선비들이다. 김정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문예인이기 이전에 정치인이던 김정희가 10년의 세월을 고증학에 바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무렵 추사의 속내를 가늠할 수 있는 찬문이 남아 있다.
이미 주희가 공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다 설명했는데, 무엇이 답답하다는 것이고 무엇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인가. 추사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향해 “공자께서는 그리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고증학을 연구하던 것이다.
결국 추사가 조선에 공자를 직접 모셔오려 한 것은 조선 성리학의 폐해와 허구성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추사의 큰 뜻은 효명세자(후일 익종으로 추존)의 스승으로서 왕세자가 부왕 순조의 대리청정 하고 있을 때 잠시 펼치려 했으나, 그의 요절로 꺾이고 만다. 복권한 안동김씨들은 추사를 제1의 위험인물로 표적 삼았다.
그들의 세도를 흔들림 없이 한 것은 조선성리학이라는 이념의 독점인데, 추사는 바로 그 이념에 근본적인 도전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추사를 제거하려 했고, 추사는 이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정치적 의지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했다. 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서화였다. 자신의 복귀를 위한 노력과 흥선대원군을 통한 정치적 목표의 추구는 모두 정적들이 알아볼 수 없는 서화 속으로 감춰지게 된다. 그가 숨겨놓은 한 글자, 하나의 선과 점도 쉬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살던 천재 김정희의 정치관과 정책 방안이 교묘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의 서화 속에 숨은 추사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