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8〉
무변신보살이 곧
여래이기 때문에
응당 못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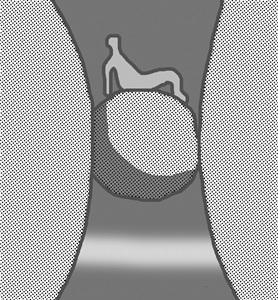
불법은 무념, 무상, 무주
이런 저런 말들은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게
가르치는 방편
불법은 불이의 중도
견해만 없으면 즉시 무변신
견처가 있으면 곧 외도
여래란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
낙처를 살필줄 알아야
묵연히 계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일승(一乘)의 도가 있을 뿐,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단지 부처님의 방편설 만은 제외한다.”고 하셨다.
한 마음에 대한 안목이 투철해지면 오직 일승만 실상일 뿐이고, 이승이나 삼승은 이미 구질구질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선은 오직 불이(不二)의 실상만 직지(直指)할 따름인 것이다. 다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어리석은 눈높이에 맞추어 그때그때 방편을 베푸신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니 예외로 한다. 후대에 와서 명안종사들이 언하(言下)에 계합해 들어오지 못하는 공부인을 위해 간화(看話)의 장치를 시설했던 것도 같은 노파심절에 의한 것이다. 위의 게송은 《법화경》의 〈방편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7. 무변신보살
배휴가 물었다.
“무변신보살(無邊身菩薩)은 왜 여래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배휴 재상은 황벽스님과 만나기 전에 이미 규봉종밀(圭峰宗密) 스님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종밀은 화엄종 5조인 동시에 선종인 하택종 5조이기도 해서, 교(敎)와 선(禪)에 두루 밝았다. 그래서 배휴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된 것이다. 무변신보살이란 ‘가없는 몸의 보살’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테두리가 없는 무경계의 보살인데, 그런 보살이 왜 여래의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황벽선사가 대답했다.
“실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변신보살이란 곧 여래이기 때문에 응당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무변신보살은 곧 여래이므로, 여래가 여래를 본다는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무변신보살은 《열반경》의 〈서품〉에 나오는 보살이다.
다만 그대들에게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부처라는 변견(邊見)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중생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가르침으로 하는 말이다. 또한 있다[有]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있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없다[無]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없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범부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범부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성인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게 하여 성인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불법은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로서, 이런 저런 말들은 모두 공부인으로 하여금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가르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부처는 중생과 함께 양변을 이루므로, 부처를 구하면 곧 부처라는 변견에 떨어지게 된다. 미혹한 사람은 뭔가 잘 해보려고 ‘좋은 것’을 구하지만, 그 좋은 것은 곧 나쁜 것과 양변을 이루므로, 구하는 즉시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에 떨어지는 것이다. 불법은 불이의 중도다.
다만 모든 견해만 없으면 즉시 ‘가이 없는 몸[無邊身]’이다. 만일 무엇인가 견처(見處)가 있으면, 곧 외도라고 한다.
불법은 본래 청정으로 툭 트여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무언가 보았다거나 얻었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변견을 붙잡고 국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비로소 무변신과 조금이라도 상응할 분(分)이 있다.
외도란 모든 견해를 즐기지만, 보살은 모든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래란 곧 모든 법에 여여(如如)하다는 뜻이다.
외도란 분별적 견해에 탐착하여 밖으로 마음을 일으켜 나가기 때문에 외도라고 하는 것이다. 반면 보살은 다만 본래성품에 묵연히 계합하여 적적(寂寂) 부동할 따름이다. 보살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조금도 움직인 바가 없다. 여래란 어떤 경계를 만나도 늘 여여하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허공은 흔적 없이 여여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미륵도 또한 그러하고, 모든 성현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여여한 즉 남[生]이 없고, 여여한 즉 멸(滅)도 없다. 여여한 즉 봄[見]도 없고, 여여한 즉 들음도 없다. 여래의 정수리는 즉시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뚜렷이 본다는 것 또한 없으므로 뚜렷하다는 변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여여부동(如如不動)’한 것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인과가 붙을 수 있겠나? 그 자리는 인과법이나 연기법과도 상관이 없다. 수없이 돌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불가사의 하다고 하는 것이다. 안목을 연 사람만이 그 근본 실상자리를 살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무변신보살이 여래의 정수리를 보니 안 보니 하는 말에 떨어지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그 낙처를 살필 줄 알아야 이런 말에 동요되지 않고 묵연히 계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 몸은 함이 없어서[無爲] 수로 셀 수 있는 범주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변신보살처럼 부처님 몸 또한 가이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크다고 하면 가장 크고, 작다고 하면 가장 작다. 그것을 이제 ‘공(空)’이라고도 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연기법에 따라서 크거나 작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보여진 모습으로는 그 실상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크거나 작다는 양변에 떨어지지 말고, 즉각 당처에 착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